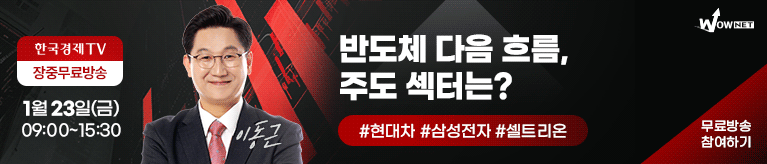7일(현지시간) 이른 아침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의 손꼽히는 부촌인 어퍼 웨스트 사이드(UWS) 83번가에 이삿짐 차량 두 대가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도심 이탈 수요가 늘었지만, 이곳은 유난하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자신을 니콜라스라고 밝힌 한 주민은 “작년만 해도 깨끗했던 거리가 노숙인 천국으로 바뀌었다”며 “나도 가능하면 멀리 이사하고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센트럴파크를 끼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다코타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브랜든 씨는 “공원에선 1분에 한 명씩 노숙인을 만날 정도로 많다”고 했다.
7일(현지시간) 이른 아침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의 손꼽히는 부촌인 어퍼 웨스트 사이드(UWS) 83번가에 이삿짐 차량 두 대가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도심 이탈 수요가 늘었지만, 이곳은 유난하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자신을 니콜라스라고 밝힌 한 주민은 “작년만 해도 깨끗했던 거리가 노숙인 천국으로 바뀌었다”며 “나도 가능하면 멀리 이사하고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센트럴파크를 끼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다코타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브랜든 씨는 “공원에선 1분에 한 명씩 노숙인을 만날 정도로 많다”고 했다.수백만달러짜리 주택이 즐비한 이곳이 ‘기피 지역’으로 전락한 건 지난 4월부터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자 뉴욕시는 노숙인을 호텔로 대거 이주시키는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노숙인이 기존 쉼터에 집단 거주하면 코로나 확산 위험을 키울 것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노숙인 중 상당수가 UWS 지역에 몰렸다. 이곳에 부티크 호텔이 밀집해 있어서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호텔 중 20%가량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장기 투숙 중인 노숙인만 800여 명에 달한다는 게 뉴욕시 설명이다. 원래 하루 300~400달러였던 방값은 노숙인 한 명당 175달러로 책정됐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뉴욕시가 숙박료를 분담한다.
문제는 호텔 이주 초기부터 터져 나왔다. 노숙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며 구걸, 폭행, 마약, 강도, 방뇨 등을 일삼았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노숙인들이 초등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역언론 보도도 나왔다.
실제 범죄율도 높아졌다. 지역 강도 사건은 지난달 11건으로, 작년 동기(3건) 대비 약 네 배 늘었다. 월세를 못 내 쫓겨나는 임차인이 많은 상황에서 뉴욕시가 노숙인을 고급 호텔에 재우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뉴욕시를 떠나는 부촌 주민이 급증하자 “정책 양보는 없다”고 외쳐온 시도 한 발 물러섰다. 납세자가 줄면 재정 부족 악순환이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민주당 소속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조만간) 노숙인들을 다시 쉼터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기존 정책을 철회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 노숙인 쉼터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뉴욕시의 노숙인 호텔 수용이란 전례 없는 실험은 사회 갈등만 부추긴 채 ‘계륵’ 처지가 됐다.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