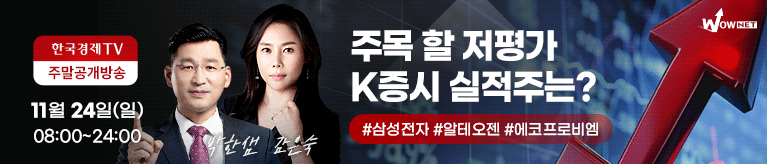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시장독점이 보장된 이 무풍지대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큰 위협이 아니다. 해묵은 관료적 행정과 낙하산 인사, 방만 경영 때문에 비판받는 공기업에 대한 얘기가 좋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시장독점이 보장된 이 무풍지대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큰 위협이 아니다. 해묵은 관료적 행정과 낙하산 인사, 방만 경영 때문에 비판받는 공기업에 대한 얘기가 좋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노동이사제 도입이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2명, 500명 미만인 기관에는 1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근로이사’가 보편화된 유럽에선 사측도 긍정적이라는 이 제도의 도입이 늦었다고 하는 우리 노동계는 독일보다 급진적이라는 우려에 대해 구상유취(口尙乳臭)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익성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맞는 얘기인가.
우선, 독일은 경제시스템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다르다. 독일은 영·미식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중심으로,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다. 회사의 감독이사회에는 주주 외에도 근로자와 채권자가 참여한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좋은 것도 아니다. 학계에선 감독이사회의 공동결정으로 인한 유연성 부족과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노사문화도 다르다. 유럽은 오랜 경험으로 중대한 고비마다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이 있지만, 우리 노사관계는 타협에 익숙하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건 노조의 지지를 받는 노동이사는 독립성·전문성보다 정치력이 우선시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는 노사관계가 우호적인 유럽의 일부 국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실효성이 없어 도입을 철회했으며, 독일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됐을 때의 문제점들이다.
그러면 이 제도가 공기업엔 적절한 건가.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세상이 변해도 ‘철밥통’ 공공부문의 혁신과 개혁은 어렵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 성과를 예산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할수록 기관의 예산이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성과를 실적보다 더 확보한 예산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혁신을 어렵게 한다. 둘째, 민간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와 종업원, 거래기업과 지역사회를 모두 만족시키지만, 공기업은 딱히 돈벌이만 목적이 아니다 보니 챙겨야 할 이해관계자집단이 많은 게 혁신을 어렵게 한다. 셋째, ‘최소 투입·최대 산출’의 경제논리보다 도덕적인 절대선을 우선시하는 공공성의 프레임이 혁신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혁신과 개혁을 요구받으면 이들은 이를 기관의 기본임무와 존재 이유,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반발한다.
그래도 공공부문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세기 들어 민간부문보다 두세 배 더 성장한 선진국들의 공공부문은 너무 비대하다. 공공기관에 기업의 경영관리 방식을 정착시키는 일은 지금 세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현대경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의 저서 《기업가 정신》에 담긴 얘기다. 드러커가 우려했던 극단적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섣부른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 노동계가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면 초록동색인 기관장과 노동이사 간에는 견제보다 담합, 대리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혁신과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 지금도 잘 작동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방만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게 먼저다. 공공기관의 주주는 국민이다. 지배구조를 바꾸려면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 ‘신의 직장’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노조의 참여가 옳은 건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