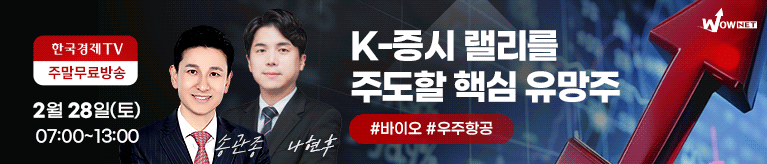정부는 지배구조개선, 대주주 견제, 금융그룹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말한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참 거리가 먼 규제법으로 체질 개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만 해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외 입법사례를 찾기 힘들다. 공정법의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규제’ 역시 ‘갈라파고스 규제’다. 융복합이 핵심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업법 제정도 시대착오적이다.
‘기업 때리기 3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투자감소와 경영위축이 불가피하다. 개정 공정법에 맞춰 대기업집단 16곳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만 약 3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외 투기자본들의 간섭과 압박도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정위 고발 없는 검찰 수사가 허용돼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발이 남발되고, 중복·별건수사가 횡행할 우려도 크다.
제대로 된 토의과정 없이 졸속 추진되는 점도 문제다.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며 자동폐기된 법안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갑작스레 입법예고한 금융그룹감독법도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될 정도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특정 대기업을 옥죄고 장악하려는 ‘표적입법’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무슨 일에든 시기와 순서가 있는 법이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경제시국 돌파를 다짐해온 정부가 코로나 2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기업 때리기 3법’을 꺼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선방 중”이라는 정부의 자찬도 실은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지배구조 개편으로 세월을 허송케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자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