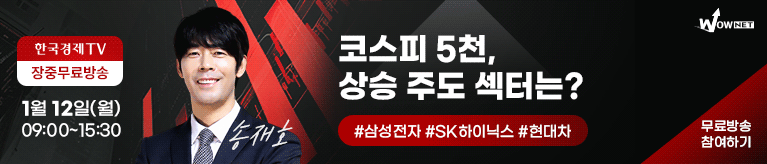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기술주기가 길고 암묵지(暗默知)가 많은 산업이다. 한국이 진입장벽이 높은 장수기술형 산업구조로 가려면 소·부·장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을 각오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기술주기가 길고 암묵지(暗默知)가 많은 산업이다. 한국이 진입장벽이 높은 장수기술형 산업구조로 가려면 소·부·장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을 각오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직면할 난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생산을 한다고 끝이 아니다. 수요 대기업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독자 브랜드로 경쟁하려는 순간, 외국업체의 상상하기 어려운 견제와 방해, 공격이 가해진다. 주문이 갑자기 끊어지는가 하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과 가격 덤핑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여기서 숱한 기업들이 쓰러진다. 살아남으려면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상대가 눈치 채지 못하게 비밀작전도 불사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중국 덩샤오핑 식의 도광양회(韜光養晦)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정부가 소·부·장을 안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결기를 다질수록 더 냉정해져야 한다. 현실은 반대다.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놓고 우리가 이겼다는 듯이 떠벌리고 있다. 한국이 초조함과 콤플렉스를 표출하고 있다고 일본이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은 이것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조치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했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전망이 틀린 게 아니다. 일본이 명분만 확보하면 언제든 한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출규제라는 수단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생사가 걸린 국내 기업인들이 화급히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관리 모드에 들어간 불안한 현실을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생산차질도 없고 과거에 없던 성과까지 가져다 준 고마운(?) 일본의 수출규제라면 그냥 놔두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원상회복 요구는 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생산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수출규제라는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비용이요, 부담이다. 일본과 거래하는 회사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산화, 공급처 다변화에 들어간 자원도 수출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기회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보니 되더라”는 발언도 받아들이기에 따라 소·부·장 기업인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망할 걱정 없는 정부가 생사의 운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며 기술개발을 해오던 기업인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면 된다’는 식의 군대식 급훈을 들고나오는지, 그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내놨다. 소·부·장의 진화가 아니라 계획의 진화다. 지금까지 나온 계획만 놓고 보면 한국은 벌써 세계 최고의 소·부·장 강국이 되고도 남아야 한다. 계획 자체를 성과로 여기는 정부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대통령 발언 중에 그나마 의미 있게 들린 건 “소·부·장은 산업 안보”라는 대목이다. 산업 안보 역시 우리보다 먼저 알아차린 국가는 일본이다.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산업의 정밀한 가치사슬을 분해해 국가별로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상대국의 ‘급소’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다. 불행히도 한국의 산업정책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형국이다.
대통령과 산업계 간 인식의 괴리가 심해진 데는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발언록과 산업부 보도자료가 다르지 않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산업현장을 제대로 알려야 할 부처가 정치논리를 대변하는 부처로 전락하고 말았다. 기업인이 외면하는 산업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