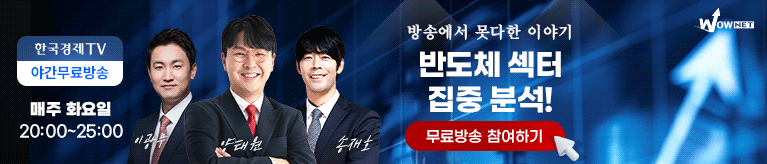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월례행사'처럼 대책 내놓는 나라 OECD에 어디 또 있나
정부가 이번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22번째가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8개월간 1.7개월에 한 번꼴로 집값 대책을 수립한 셈이다. 대책이 잦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모두 틀렸기 때문이다.최근 집값이 오르는 것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잠재수요가 상존하는 가운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탓이다. 월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 전세 세입자는 내집 마련, 작은 집에 산다면 좀 더 넓은 집, 그것도 더 좋은 동네의 집을 갖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이런 잠재수요 속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택수요에 불이 붙은 것이다. 금리는 0%대로 떨어졌고,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놓았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만 1500조원을 넘는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줄어 수요 초과현상이 생겼고, 이것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 탓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대출과 재건축을 규제하는 미시적 수요억제책으로 일관했다. 풍선(주택수요)이 부풀어 오르면 바람을 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걸 짓누르다 보니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풍선효과만 되풀이된 것이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핀셋 규제’라며 대책을 내놓지만 증시에서 자금이 우량주에 몰리듯 넘치는 자금은 서울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문제라면 이 돈이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금과 규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 중에 부동산 대책을 ‘월례행사’처럼 내고, 그것도 금리 등 거시정책이 아니라 세금·대출·지역제한 등 미시정책으로 대처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두더지잡기식 대책을 남발하다 보니 정책 신뢰도는 뚝 떨어졌고,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택수요를 부채질한 측면도 있다. 정부가 투기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는 한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