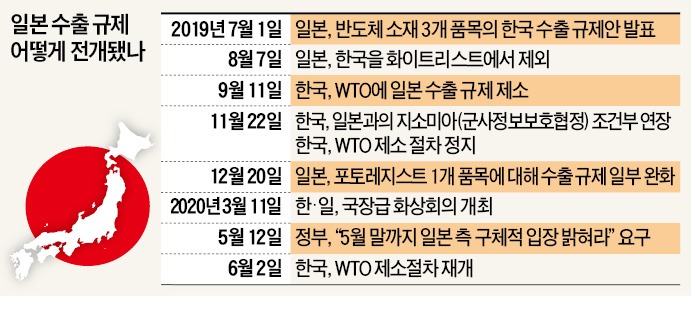
이는 일본이 당초 의도와 달리 국제사회의 비난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서 한국이 전략물자 관련 관리가 소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일본 내에서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 보복에 나서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때문에 일본 당국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2~3개월 지연시켜 한국 기업들을 골탕먹이기는 했지만 전면 수출 불허는 취하지 않았다.
일본이 핵심소재 수출을 금지해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한국산을 쓰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전자업체도 생산에 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수출 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다’라는 자국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포장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도 상당히 신경 썼다는 전언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한·일 간의 공조에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고 나선 것이 아베 정부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한국이 지난 1년간 핵심소재 관리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 없이 일본 정부가 먼저 수출규제를 풀 가능성은 낮다는 게 공통된 전망이다. 오히려 법원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이를 명분 삼아 새로운 경제보복을 준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