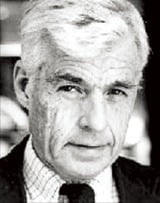 17~18세기는 ‘이성의 시대’였다. 이성의 근육을 키운 인류는 19세기에 번영을 달렸고, 그 들뜬 분위기는 20세기 초입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파시즘이 등장하자 20세기는 한순간에 야만과 반(反)지성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로버트 팩스턴의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은 파시즘의 전개 과정과 이면을 치밀하게 복기한 노작(勞作)이다. 전후 60여 년 지속된 파시즘 관련 여러 논쟁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7~18세기는 ‘이성의 시대’였다. 이성의 근육을 키운 인류는 19세기에 번영을 달렸고, 그 들뜬 분위기는 20세기 초입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파시즘이 등장하자 20세기는 한순간에 야만과 반(反)지성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로버트 팩스턴의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은 파시즘의 전개 과정과 이면을 치밀하게 복기한 노작(勞作)이다. 전후 60여 년 지속된 파시즘 관련 여러 논쟁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20세기의 악몽’ 파시즘은 ‘천의 얼굴’을 보였다. 전형적인 형태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파시즘 국가(1922~1943년)와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 국가사회주의 나치 국가(1933~1945년)다.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스페인 벨기에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파시즘 운동이 꼬리를 물었다.
팩스턴은 “파시즘은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태어났다”고 봤다. 당시 시대상에 대해 팩스턴은 “종전 무렵 유럽은 재건 불가능한 구세계와, 그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신세계로 분열됐다. 인플레는 부르주아적 가치를 비웃으며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았다”고 썼다. 또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이 거둔 승리와, 더 산업화된 독일에서마저 레닌 추종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간계급과 상류층을 두려움으로 몰았다고 진단했다.
파시즘은 ‘이즘’이 아니라 ‘결집된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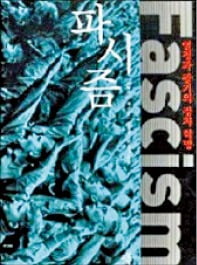 그리하여 낙관적 미래 전망이 불신받고 ‘인류의 자연스러운 조화’라는 자유주의적 가정은 의심받았다.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같은 기존 정치제도의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긴장이 야기됐다”는 게 팩스턴의 분석이다. 파시스트들은 타인을 지배하게 하는 것, 민족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진리로 간주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눈엣가시처럼 여겼고, 마르크스적 평등주의에는 생래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팩스턴은 파시즘이 ‘기형적인 우익 사상’이라는 피상적 인식도 반박했다. “무솔리니는 정권 접수 1년 뒤에도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낙관적 미래 전망이 불신받고 ‘인류의 자연스러운 조화’라는 자유주의적 가정은 의심받았다.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같은 기존 정치제도의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긴장이 야기됐다”는 게 팩스턴의 분석이다. 파시스트들은 타인을 지배하게 하는 것, 민족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진리로 간주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눈엣가시처럼 여겼고, 마르크스적 평등주의에는 생래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팩스턴은 파시즘이 ‘기형적인 우익 사상’이라는 피상적 인식도 반박했다. “무솔리니는 정권 접수 1년 뒤에도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생각했다”는 주장이다.여타 ‘이즘’과 달리 파시즘에는 지적 토대나 강령이 없다. 일관되고 논리정연한 정치사상이 아니라 일련의 ‘결집된 열정’에 연결돼 있을 뿐이다. 역사를 선과 악, 순수와 타락의 이항 대립으로 보는 음모론적 시각에 지배된다. 파시즘은 다른 어떤 정치운동보다 청년반란 선언에 가까웠다. “제복을 갖춰 행진하는 것은 부르주아 가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여겨졌다”는 게 팩스턴의 관찰이다.
파시즘은 악마화된 ‘적’을 필요로 했다. 테러가 빠지지 않은 이유다. 폭력이 공공연했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척 흘렸다. 보호받는 국민과 ‘반(反)사회적 집단’이 엄격히 구분돼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체제의 적들에게서 시작된 폭력은 파시즘의 ‘보수파 동맹 세력’을 거쳐, 결국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무차별 행사됐다”고 팩스턴은 전한다. 개인의 권리는 사문화됐고 사법에서의 ‘적법 절차’도 무시됐다. 팩스턴에 따르면 “공동체가 처한 위기가 너무 심각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작용’만으로는 단결을 이룰 수 없다”는 게 파시스트들의 변명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영구혁명’ 폭주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다. 팩스턴은 “파시즘의 권력 장악은 언제나 보수 엘리트층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나치 독일을 통치한 당·기업·군·고위공직자들의 연합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이익과 권력, 특히 두려움에 의해 한데 뭉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시즘을 지탱한 핵심은 경찰과 사법부였다. “독일 경찰은 나치친위대(SS)로 개편된 대가로 특권을 누렸다”고 팩스턴은 고발한다. 자신들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약속 아래 판사들도 사법기관을 나치 조직에 복속시켰다. 지식인들은 예술과 과학을 통제 대상이자 국가 자원으로 본다며 초기엔 파시즘을 불쾌해했다. 하지만 파시즘 정권은 지위와 명예로 포상할 줄 알았다. 그런저런 이유로 하이데거 등 당대 지성들까지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파시즘 정권은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질주하는 힘, 즉 영구혁명의 인상을 만들어내야 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역사와의 특권적 관계’를 실행하기 위해 무모하고 강박적인 돌진을 거듭하다 자멸할 운명이었다”는 진단이다. 파시즘은 1945년 종전과 함께 막을 내렸다. 초유의 실험이 가져온 반작용은 이후의 국제 정치에 깊숙이 투영됐다. 스탈린이 투옥시킨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유는 《옥중수고》로 기록돼 ‘네오 마르크시즘’을 열었다.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 학자들이 중심이 된 프랑크푸르트학파도 전후 거대한 현대적 사조의 일단을 차지했다.
파시즘은 부활할 수 있을까. 대중의 반감이 워낙 강한 탓에 무망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팩스턴은 고전적 파시즘의 외적 특징이나 상징과는 다른 새로운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이 1930년대 유럽보다 크다고 강조한다. “파시즘이 취하는 겉모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경고다. 오늘 우리 안의 파시즘적 징후는 무엇일까 돌아보게 하는 결론이다.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