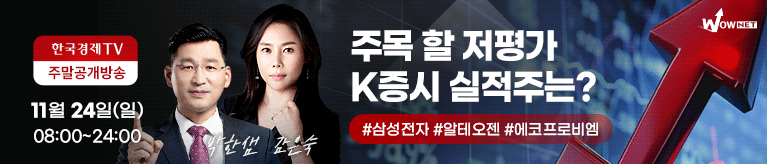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 실물과 금융 부문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최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내놨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노후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 실물과 금융 부문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최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내놨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노후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이번 대책에서 건설발 뉴딜 정책은 논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값 급등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등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려하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도로 철도 항만 같은 SOC 사업이 외면받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 같다.
하지만 건설업만큼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좋은 업종도 많지 않다.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고, 180만 명 안팎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게 건설업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프로젝트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꼽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쇠퇴한 구도심의 낡은 주택을 고치고 주차장 등 생활편의 시설과 주민 공유 공간을 만들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전국의 낙후 지역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을 투자해 앞으로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다섯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이 도시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깊다. 중심시가지형은 면적 20만㎡ 이상의 상업지역에서 노후 시장 등을 개량하고,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등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50만㎡ 이상 규모의 사업지가 대상이다. 역세권 주변에서 주거·상업·업무 복합시설을 지으면 대도시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용적률 상향 같은 특혜 논란은 임대주택 건립 같은 기부채납(소유권 무상이전)으로 차단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활력소는 민간 자본의 투입이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와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가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꼽히는 것도 민간의 창의력 덕분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민간이 설 자리가 좁다. 수익성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선입견의 장벽이 높아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28개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14곳이 수익성 부족 문제로 민간이 참여하지 못했다. 공적 재원에 매달려 ‘벽화만 그리는 방식’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양산되는 이유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역할만 강조한 ‘반쪽짜리 재개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을 도시재생 사업의 파트너로 인정하면 일자리를 만들 프로젝트가 수두룩하다”는 게 개발업계의 목소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 통화량이 불어나고 있다. 부동자금을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재생 사업에 투입하면 도시의 경쟁력이 커지고 일자리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