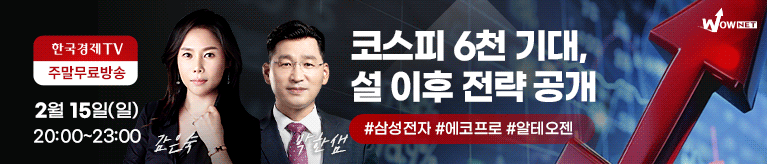화웨이(華爲)만큼 중국적인 기업도 드물다. 회사명부터 ‘중국을 위하여’라는 의미다. 회사 측은 ‘중화유위(中華有爲)’라고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한다. ‘중화(민족)를 위해 분투한다’라는 뜻이다. 1987년 회사를 세운 런정페이 회장이 인민해방군 출신이어서 국가적·민족적 색채가 덧입혀지는지 모른다.
화웨이(華爲)만큼 중국적인 기업도 드물다. 회사명부터 ‘중국을 위하여’라는 의미다. 회사 측은 ‘중화유위(中華有爲)’라고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한다. ‘중화(민족)를 위해 분투한다’라는 뜻이다. 1987년 회사를 세운 런정페이 회장이 인민해방군 출신이어서 국가적·민족적 색채가 덧입혀지는지 모른다.기업의 국적과 역사, 사풍(社風)으로 보면 창업자의 성(姓), 가문을 많이 쓰는 일본 기업들도 고유의 국가적 정체성을 풍긴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다국적 대기업으로 성장해도 창업 때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LG SK 포스코 KT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면서 적극적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한국 기업과 비교된다.
통신장비 세계 1위, 스마트폰은 2위인 중국 간판기업 화웨이가 국제 경제·산업계에서 연일 ‘뉴스의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新)냉전’ 한가운데 선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무서울 정도다. 최근에는 영국의 정책도 바꿨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키로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어떤 협의가 있었을까. 지난해 5월 미국의 1차 중국 제재 블랙리스트 발표 때부터 주 타깃은 화웨이였다. 엊그제 나온 미국 상무부의 3차 블랙리스트를 보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겠다는 차원을 넘어 아예 중국의 ‘제조 2025’ 구상의 핵심 기업들을 고사시키겠다는 기세다.
화웨이 대응도 만만찮아 보인다. 연구인력만 8만 명에 달하는 기술력과 세계 170여 개 진출국의 네트워크에다 중국 정부의 지원도 있다. 화웨이가 SOS 보내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면 미국과 장기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미·중 신냉전이 격화될수록, 화웨이가 성장 슬로건인 ‘늑대정신’을 내세울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고민도 깊어갈 것이다. 공화·민주 양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쉽게 굴하지 않는 중국과 화웨이의 행보도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국과 중국은 1, 2위 시장이다. 어느 한쪽만 보기 어렵다. “양쪽 사이에서 칼자루가 아니라 칼끝을 쥐고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 비유다. 세계를 제패한 ‘반도체 1등 한국’의 역설적 고민이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