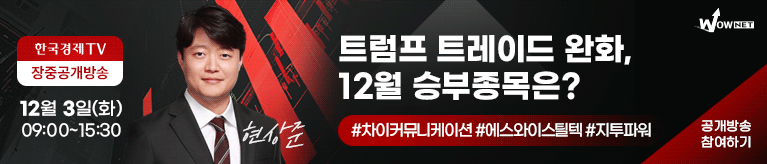본사가 대리점에 판촉사원을 파견한 뒤 인건비를 일부라도 부담시키면 불공정행위로 처벌받는다. 인테리어와 경비 등 각종 서비스 업체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해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침에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판단한 세부 내용이 담겨 기업과 대리점 입장에서 특정 행위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시행 이후 3년5개월 동안 각종 사례가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정리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끼워팔기’와 관련해 대리점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불이익을 줬거나, 판매 목표치에 미달한 물건만큼을 떠안겼다면 위법이다.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뒤 관련 비용을 대리점 측에 대라고 하거나 대리점에 소속된 직원이 임의로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신규 고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 지급을 미루거나 줄여서도 안 된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것도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 안에 판매 수수료율과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바꿔도 법 위반에 속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갑질’ 외 대리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리점이 본사 주문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 과거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열거한 문제에 해당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대리점이 인기 제품을 대거 사들였다가 팔리지 않으면 반품하는 등 대리점법을 악용하는 측면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식품회사 대리점주는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지나치게 ‘갑을관계’에 맞춰 해석했다”며 “대리점으로서 최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충, 방재 등 서비스 업체는 본사가 지정해주는 편이 단가 등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관련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심사지침 행정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박종필 기자 autonomy@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