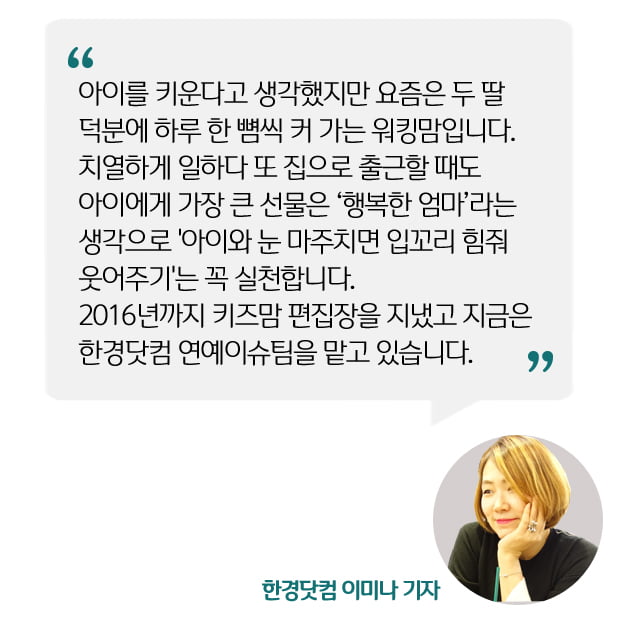"엄마! 이제 뭘 눌러야 해?"
"엇 엄마! 화면 꺼졌어. 어떻게 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초등학교 개학. 드디어 온라인 개학일이 정해지면서 이제 긴긴 고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줄 알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태권도 학원도 미술학원도 휴강에 돌입하자 아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할 수 있어 행복했겠지만 맞벌이 가정에 끝나지 않는 길고 긴 방학은 내게 카오스 그 자체였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밥도 지어놓고 반찬 또는 간식을 준비해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전날 저녁 미팅이 있었다거나 야근을 한 다음날은 아침에 내 몸 하나 추슬러 출근하는 것도 정신이 빠질 지경이었다. 이런 날이면 아이는 회사에 있는 내게 전화를 걸어 '파스타가 먹고 싶다', '치킨 시켜달라'면서 집에 먹을 게 없다고 어필을 해 댔다.
'외식 음식은 그만 먹어야 한다'고 타일러봤지만 어제 먹었던 김치찌개, 멸치볶음에 김 싸서 또 먹어야 하느냐는 아이의 말에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이러는 사이 나는 배달 앱 우수회원이 돼 있었고 아이는 '확찐자'가 됐다.
드디어 온라인 개학 첫날.
반차를 낸 나는 두 자녀를 서둘러 깨워 학습사이트 ‘클래스팅’에 접속해 출석을 시도했다.
하지만 10분~20분을 기다려도 도무지 접속이 되지를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400만의 동시접속자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결국 10시가 다 돼서야 접속에 성공했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1~2교시 국어, 3~4교시 수학, 5~6교시…수업을 들었다.
두 아이 수업과정이 달라서 이방 저방을 오가며 혼이 빠지기 일보 직전.
그나마 EBS 강의를 들어야 하는 첫째는 상황이 나았지만 선생님이 내준 과제물로 수업하고 필요할 경우 유튜브를 보는 둘째는 싱겁게 6교시 수업이 다 끝나 있었다.
수업 일정은 빡빡해 보였지만 과제물을 다 제출해도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뭘 빼 먹은게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그게 다였다.
그 와중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둘째는 10번도 넘게 탭을 잘못 터치하는 바람에 "엄마! 빨리 와봐요!"를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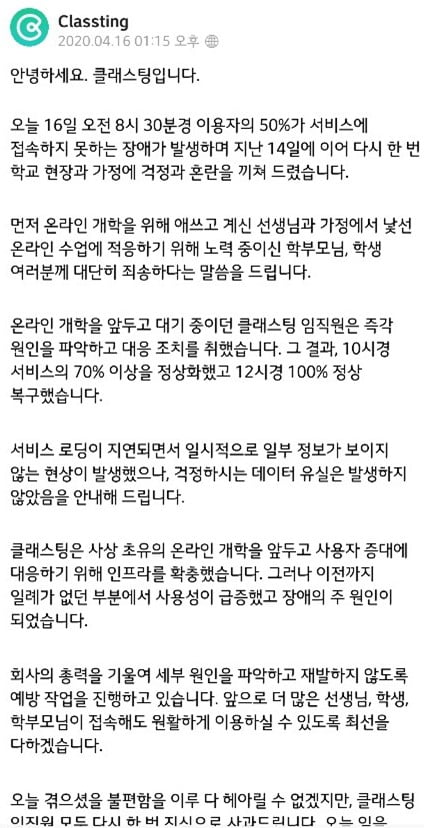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할 줄도, 감염성 질환으로 초등학교 개학이 사상 최초로 연기될 줄도 몰랐던 나는 이러려고 내가 아이들 폴더폰 사주고 스마트 기기 덜 접하게 한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최대한 늦게 노출하는 게 좋은 건 줄로만 알았던 내 의식에 역풍이 밀어닥친 것이다. 기껏해야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게임 앱을 플레이하는 정도의 기능만 할 줄 알았던 초등학생에게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찾아서 읽는 것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작업이었다.
폴더폰을 쓰는 아이는 그동안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언젠가 접하게 될 스마트 기기였다면 일찍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게 지도했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아는 동네 엄마에게 물어보니 평소 가정에서 e러닝 수업등을 하고 스마트 기기를 익숙하게 다뤘던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선생님 지도대로 영상을 플레이하고 제출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제 초등 1∼3학년을 끝으로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 약 540만 명이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다. 지역과 학교, 가정환경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데 언제 제대로 된 등교를 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져만 간다. 이미 온라인 강의로 진도를 나간 부분을 재복습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가정 내 자기주도학습이 습관화 돼 있지 않은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처럼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 세상에 어두운 아이는 또래 친구들에 한참 뒤처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첫날 난리 통 끝에 수업이 끝났지만 난 온라인 개학 둘째 날도 제때 출근을 하지 못했다. 왜 모두들 아이 개학이 아닌 사실상 ‘부모 개학’이라고들 하는지 뼈져리게 느낀 날이었다.
아직도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나는 "출석 체크해서 수업 듣고 있어?"라고 불안한 목소리로 묻는다.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아이 목소리에서는 어느새 여유가 느껴질 정도다.
"응 엄마 꼭 9시에 등교해야 하는 거 아니더라. 숙제? 그거 좀 이따 천천히 제출해도 돼. 나 잠시 게임 좀 할게."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