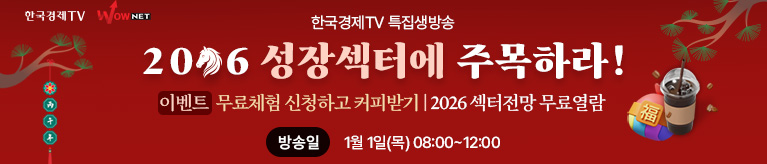신한은행이 순이익 목표를 내려 잡은 것은 1982년 은행 창립 이후 처음이다. 국내 은행을 통틀어 가장 순이익을 많이 내는 신한은행이 목표치를 낮춘 것은 파격이란 분석이다.

“작년만큼 벌긴 힘들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순이익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은 2조2000억원 안팎으로 잡았다. 2조4000억원가량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보다 최소 1200억원, 최대 2400억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이같이 낮춘 목표치를 신한금융그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이 연간 순이익 목표를 낮추는 건 이례적이다. 전년보다 5% 이상은 늘려잡는 게 관례다. 아무리 경영 상황이 어려워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목표를 두는 식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주요 대기업의 순이익이 고꾸라질 때도 매년 실적 경신을 이어오던 은행권마저 순이익 목표를 낮춘 건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투자상품 개수 줄여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에는 ‘수익성보다 고객 만족 및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신한은행도 올해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투자상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취급하는 투자상품 가짓수를 줄이고, 고위험 상품은 아예 팔지 않을 방침이다. 순이익이 종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객 수익률을 직원 평가지표(KPI)에 반영하도록 하는 ‘같이성장 평가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했다.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했는지, 사후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상품 판매 실적 위주였던 체계를 바꾼 것이다. 일부 영업점은 실적 경쟁에서 예외를 두는 실험에도 나섰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최근 “양적인 1위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진 행장은 “당장 순이익을 얼마나 내느냐보다 중장기적으로 ‘내 돈을 맡기고 싶은 은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순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고객 중심으로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의 신뢰를 얻으면 결과적으로는 순이익도 오를 것이란 판단이다. 여기에 저금리·저성장 기조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요 수익원이던 이자 장사로 실적을 내기도 여의치 않아졌다.
2018년 우리은행보다 세 배 많은 3000억원을 베팅해 따낸 서울시금고도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시금고에는 정보기술(IT) 전산망 구축비용(1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4000억원이 투입됐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1년에 1000억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딩뱅크 기준 달라질까
이대로라면 올해 순이익 1위를 기준으로 하는 리딩뱅크는 국민은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매년 엎치락뒤치락하며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다. 2017년엔 국민은행이, 2018년엔 신한은행이 리딩뱅크를 차지했다. 이들은 각 금융그룹에서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 간 리딩금융그룹 경쟁도 좌우했다.
리딩뱅크를 따지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부분 라임, DLF 사태를 계기로 고객 만족도 중심으로 내부 평가지표를 잇따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 신뢰, 만족도의 중요성이 커질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익보다 고객을 우선하는 건 글로벌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은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에 있지 않고, 기업과 사회공동체, 국가의 미래 성공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 장사에 기대 ‘앉아서 돈을 버는’ 식의 순이익 경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