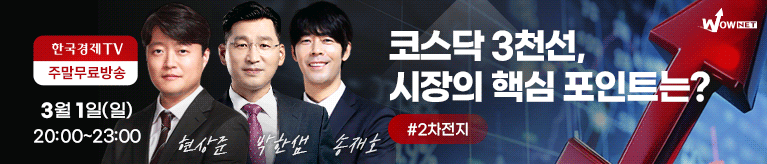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중국발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러달라는 청와대 주문은 ‘언어 상대성 가설(샤피어-워프 가설)’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본다.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세계가 아니라 언어에 투영된 주관세계라는 것이다. 우한 폐렴이든, 신종 코로나든 실재(實在)는 같지만 수용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얘기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중국발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러달라는 청와대 주문은 ‘언어 상대성 가설(샤피어-워프 가설)’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본다.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세계가 아니라 언어에 투영된 주관세계라는 것이다. 우한 폐렴이든, 신종 코로나든 실재(實在)는 같지만 수용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얘기다.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기저에 그런 언어 상대성이 도사리고 있다. 분명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본래 의미와 뉘앙스 간의 괴리가 이중언어처럼 멀게 느껴진다. 이를 테면 ‘새롭게 뜯어고침’을 뜻하는 개혁이 어느 틈에 ‘내 편에 유리하게 틀을 바꾸는 것’으로 변질됐다. 정치개혁이라는 선거제 개편이 ‘표의 등가성’을 더 훼손한 어이없는 결과를 낳은 게 그 증거다. 온갖 위성정당이 출현해 4·15 총선 투표지가 정말로 1m를 넘을지도 모른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민주적 통제’는 본래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권력 견제를 뜻한다. 그러나 당·정·청에서 이 말을 쓸 때는 ‘(선거로 집권한) 정권에 대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니 ‘우리 총장님’도 ‘기소 쿠데타’를 감행한 정치검찰로 급변했다. 조국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공정과 정의’는 사회가 지향할 가치보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뉘앙스가 더 강해졌다. 국민의 의미도 5100만 명 전체가 아니라 지지층으로 국한되고, 반대하면 ‘적폐, 토착왜구’라는 딱지를 붙인다.
정부가 ‘경제성과’를 주장할 때마다 추락하는 경제지표들 속에서 어쩌다 개선된 지표를 찾아내 ‘심봤다’고 외치는 듯하다. 자주 언급되는 ‘올바른 방향(길)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희망사항이 담긴 주문으로 들린다. ‘남북한 평화경제’는 경제가 파탄 난 북한이 무슨 뗑깡을 부리든 세계 3위인 일본을 추월할 요술방망이로 묘사된다. ‘과세 정상화’는 세금 폭탄의 완곡어법이고, 시장은 정부가 간섭해야 할 약육강식 정글의 동의어로 쓰인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도 되는 게 없으니 기득권 보호를 위한 가림막에 더 가깝다. 이쯤 되면 ‘신어(新語) 사전’을 만들어야 할 듯싶다.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명제는 조지 오웰이 《1984》의 부록에 담은 ‘신어(Newspeak)의 원리’에 적나라하게 묘사한 바 있다. ‘빅 브러더’ 국가는 말의 의미를 축소하고, 뒤집거나 모호하게 만들어 그 말이 연상시키는 의미의 확장과 쓰임을 억제했다. 온갖 정보를 통제·조작하는 기관을 ‘진리성(省)’으로 부르고, ‘equal’에서 ‘평등’의 의미를 제거해 ‘같다’는 의미만 남기는 식이다. 이를 통해 대중의 사고 폭을 줄여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신어를 통한 언어 파괴가 문명 해체와 자본주의 체제 부정으로 일관한 서구 신좌파의 기본 행동원리임을 간파한 인물이 올초 타계한 영국 사상가 로저 스크루턴이다. 68혁명을 목격한 그는 “정치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야말로 좌파의 주된 유산”이라며 “신어는 현실 기술이라는 언어의 1차적 목적을 파기하고, 현실에 대해 힘을 행사하는 목적으로 대체한다”고 갈파했다.
일례로 자본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는 경제가 자본주의인데, ‘위기, 붕괴, 착취’ 등을 뒤에 붙여 부단히 비난함으로써 자본주의도 신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들이 말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는 무수한 실패사례만 쌓았을 뿐이다.
세계적 현상이 돼버린 이념·진영 갈등은 ‘언어의 아노미’라는 전염병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소위 ‘대안적 사실’이 진실을 밀어내고,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우는 게 대유행이다. ‘트럼프의 미국’도 마찬가지다. 본뜻을 왜곡한 신어가 난무하면 현실을 베일로 가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신어로부터 언어를 구해낼 백신은 각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길밖에 없다.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