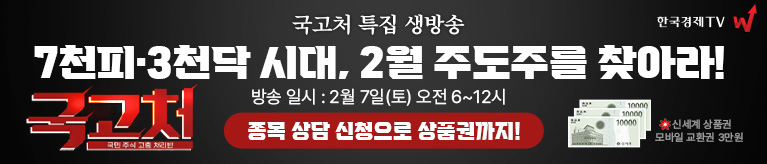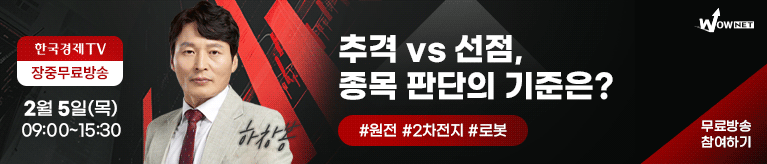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도 '악플·조작과의 전쟁'을 지속한다. 카카오는 2월 중으로 다음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폐지하고, 네이버도 실검을 포함한 포털 서비스를 지속 개편한다. 4·15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악플·조작 의혹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달 실검 서비스 폐지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중 다음 메인 화면과 뉴스 댓글을 포함한 플랫폼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작년 10월 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검 폐지 계획을 밝혔다. 개인을 향한 도 넘은 악성 댓글이 건강한 공론장을 해치고,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0월25일 카카오톡 내 샵(#) 검색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했고, 같은달 31일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과 다음에서 인물 관련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실검은 카카오의 철학과 맞지 않기에 이를 종료한다"며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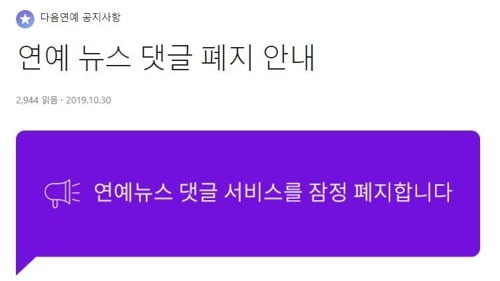
카카오가 서비스 '중단·폐지'라는 초강수로 악플·조작과의 전쟁에 나섰다면, 네이버는 서비스 '보완·개선'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실검을 연령대별로 나눠 표출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같은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가 먼저 표출되도록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어 11월 말에는 실검에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어 추천시스템 '리요'를 적용했다. 검색어와 주제 카테고리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개인별 설정기준에 맞춰 실검 순위 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초성퀴즈와 같은 이벤트·할인 정보 노출 정도를 개인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성 논란을 줄였다.
올 1월 중순 들어선 리요의 적용 카테고리를 시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로 대폭 늘렸다. 네이버는 리요의 기술을 지속해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인물 관련 연관 검색어 노출 위치도 포털 상단에서 최하단으로 변경됐다. 검색창 밑에 바로 노출되던 연관 검색어를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인물 정보 아래로 밀어냈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실험 결과 인물 검색 시 인물 관련 연관 검색어보다 인물 정보나 관련 뉴스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용성 개선'이 서비스 개편의 이유라는 얘기다. 이 역시 카카오가 인물 관련 연관 검색어를 폐지한 것과는 닮은 듯 다른 행보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 본래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리고, 역효과를 줄여나가는 것이 회사의 철학"이라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올 4월부터 언론사에 지급하던 전재료(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폐지하고, 언론사 구독 기반의 새로운 뉴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카카오도 구독 중심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업계는 4·15 총선 전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 개편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적 편향성과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실검, 댓글 서비스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심한 만큼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음은 서비스 폐지를, 네이버는 개편 중심으로 포털 서비스를 바꿔가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권과 이용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서비스 변화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