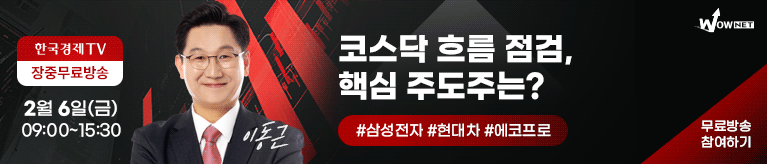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홍콩 사태’는 중국 역사에 큰 굴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짚어볼수록 그런 망신이 없다. “홍콩 광복, 시대혁명!” 홍콩 주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복속을 거부하며 외친 구호다. 한마디로 “중국이 싫다”는 얘기다. 기구한 홍콩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중국은 홍콩을 1842년 영국에 폭력으로 빼앗겼다. 중국에 더 많은 아편을 팔기 위해 우격다짐의 전쟁을 일으켰고, 압승을 거둔 영국에 전리품으로 내준 땅이 홍콩이다.
‘홍콩 사태’는 중국 역사에 큰 굴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짚어볼수록 그런 망신이 없다. “홍콩 광복, 시대혁명!” 홍콩 주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복속을 거부하며 외친 구호다. 한마디로 “중국이 싫다”는 얘기다. 기구한 홍콩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중국은 홍콩을 1842년 영국에 폭력으로 빼앗겼다. 중국에 더 많은 아편을 팔기 위해 우격다짐의 전쟁을 일으켰고, 압승을 거둔 영국에 전리품으로 내준 땅이 홍콩이다.지금 잣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폭거다. 그러나 모든 것이 힘으로 결정되던 시대였다.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뀌었다. 1997년 ‘할양기간’이 끝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은 예전의 노쇠국가가 아니다. 미국과 일합을 겨루는 ‘G2(2대 강국)’의 한자리를 꿰찼다. 경제 규모에서 세계 2위로 올라선 지 오래이며, 인터넷융합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 개발 경쟁에서도 최첨단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세를 몰아 아시아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자국 영향권에 두겠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호기를 부리기에 이르렀다.
그런 중국이 홍콩 주민들로부터 ‘딱지’를 맞은 것이다. 지난 6월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에 반대하며 시작된 홍콩인들의 시위는 자치정부 수반(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로 확대됐다. 시위는 노골적인 ‘반중(反中)’ 적대감 표출로 이어졌다. 의사당의 중국 국기를 끌어내리고 옛 영국령 시절 홍콩기를 내거는가 하면, 일부 시위자는 영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흔들어대기까지 했다. 중국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한 것은 “홍콩의 오늘이 세계의 내일”이라는 시위대의 구호다. ‘일대일로’와 함께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창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중국몽(中國夢)’이 실현된다면 전 세계가 오늘의 홍콩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홍콩인들이 이렇게까지 중국에 극력 반발하는 건 1997년 반환된 이후 언론 자유, 법치, 인권 등이 중국 수준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다. 자유민주주의 원조(元祖) 국가인 영국의 통치를 받는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와 문명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급속한 ‘중국화(化)’는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었다. 영국이 홍콩을 빼앗은 과정은 폭력적이었지만, 확고한 사유재산 존중과 법치주의 문화를 심으면서 홍콩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자유무역도시로 일궈냈다. 그런 도시에 권위주의적이고 압제적인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통치 방식이 환영받을 리 만무다.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 인접 국가에 어쭙잖은 완력을 과시하며 패권주의 속내를 드러내온 중국에 홍콩시민들이 먹인 ‘한 방’은 그저 통쾌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국력을 유지하고 키우는 방편으로서 ‘국가매력도 향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누구에게나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다”는 국가적 매력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곱씹게 한다.
스페인의 ‘지브롤터 굴욕’도 비슷한 사례다. 스페인은 북미 끝자락 멕시코에서부터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이르기까지 18개 중남미 ‘히스패닉 벨트’ 국가들의 종주국이지만, 정작 자국 최남단 지브롤터는 영국에 내준 채 돌려받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18세기 초 왕위계승 전쟁 때 영국에 기습 점령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2002년 주민 찬반투표에서 99%의 압도적 ‘퇴짜’를 맞은 이후에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법치가 보장되는 영국 시민으로 살겠다는 지브롤터 주민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국적 선택’은 영토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개인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의 ‘국적 쇼핑’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국이 공통 현상인 인구 감소의 보완책으로 출산 장려와 함께 ‘우수 외국 인력 유치’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도 이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진화해나가야 하는지 냉정한 현실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런 인식과 안목이 있는지 궁금하다.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