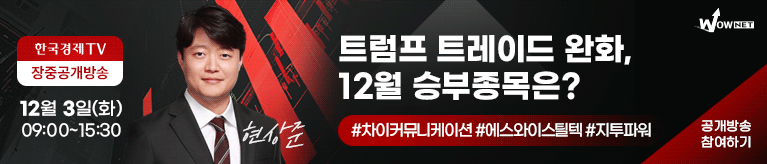1970년대까지 2.5명이 넘던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980년 1.85명, 1990년 1.77명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2000년 1.89명으로 반등했고 2010년 2.03명으로 올라섰다.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7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프랑스는 유럽의 ‘출산강국’으로 불린다. 위기를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에 예산을 투입했다. 공립 시설 비중을 늘리고 유치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다. 1970년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 1983년 2.06명으로 뚝 떨어졌다. 출산 억제 일변도의 인구정책이 폐지된 것은 1996년에 이르러서다. 저출산 대책을 세워 예산을 쏟아부은 것은 2006년부터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 늦어진 결혼 연령,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율 하락 원인은 동일했다. 하지만 정책의 관성에 의존하는 바람에 지표가 가리키는 미래를 인지하지 못했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다. 1970년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 1983년 2.06명으로 뚝 떨어졌다. 출산 억제 일변도의 인구정책이 폐지된 것은 1996년에 이르러서다. 저출산 대책을 세워 예산을 쏟아부은 것은 2006년부터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 늦어진 결혼 연령,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율 하락 원인은 동일했다. 하지만 정책의 관성에 의존하는 바람에 지표가 가리키는 미래를 인지하지 못했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인구 통계는 미래 예측의 기본이다. <또 다른 10년이 온다>는 프랑스의 인구정책과 함께 원유 매장량을 예측해 원유 의존도를 낮춘 뒤 부동산과 관광, 무역과 금융으로 영역을 넓혀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사례를 들어 미래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책을 쓴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겸 논설위원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창립 멤버다. 국제경제학 분야 전문가인 저자는 미래에셋 리서치 담당 부사장으로도 활약 중이다.
책은 시공간을 종횡으로 누빈다. 세계의 지정학적 이슈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흐름의 핵심을 짚어간다.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현상의 단면을 잘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20년 ‘또 다른 10년’을 맞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저자가 예상하는 2020년대는 2010년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다. 기존의 이론과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에서 ‘초불확실성’으로 심화된다. 저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의 위상도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여전히 중심에 있겠지만 실질적인 영향력과 국제기구의 구속력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 통화 질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시스템 없는(non system)’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자는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의 통화가 달러화를 대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가상화폐가 달러화의 위상을 위협할 정도로 부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또 한 차례 패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중국의 태세 변화가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늠해봐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고 이에 미국이 달러 약세로 맞대응할 경우다. 저자는 “그로 인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는 1930년대에 겪었던 대공황의 악몽을 꿔야 한다”며 “홍콩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커지는 불확실성 속 한국의 대응이다. ‘압축 성장’을 주도해온 경제 각료의 경직적 사고를 경계해야 하고 적극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정치적 포퓰리즘의 성행으로 노사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빠르게 고착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은 ‘지속가능한 흑자 경영’이다. 저자는 “우려되는 것은 성장 둔화의 요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것은 도피일 뿐”이라고 일갈한다. 기업가 정신을 돌아보고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며 현장과의 괴리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기업 및 정책 당국 관계자들이 새겨봐야 할 책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