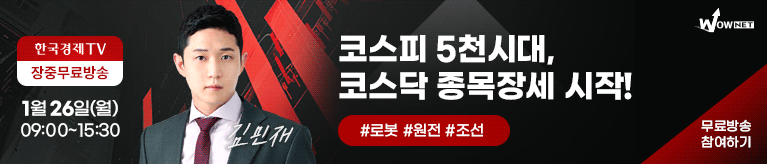평점 테러도 '82년생 김지영' 흥행을 막진 못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은 지난 8일까지 누적관객수 291만4720명을 모았다. 주말 300만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원작인 조남주 작가의 동명 소설이 사회에 파문을 던지면서 촬영도 하기 전부터 악플, 별점 테러에 시달렸지만 '82년생 김지영'은 개봉 8일 만에 순익분기점인 160만 관객을 돌파했다. 멀티플렉스 CGV 기준 '82년생 김지영' 예매자 중 76.3%는 여자였다. 여성들의 열렬한 지지가 '82년생 김지영'의 흥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82년생 김지영' 뿐 아니라 '캡틴마블'부터 '걸캅스', '말레피센트2',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까지 여성 캐릭터를 내세운 작품들이 연이어 극장가를 강타했다. 몇몇 작품들은 개봉 전후 악플, 별점테러 등에 시달렸지만, 여성 관객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수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작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몰카' 적발을 소재로 해 일부 남성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걸캅스'도 CGV 예매자 중 여성이 74.5%였다. '걸캅스'는 극장에 가서 직접 보진 않더라도 "영혼은 보내겠다"는 '영혼보내기' 운동으로 화제가 됐던 작품. '걸캅스'의 '영혼보내기'에 참여했던 관객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것. '걸캅스'는 160만 관객을 동원했다.

몇몇 남성 관객들의 반발로 젠더 갈등이 시끄럽지만 극장가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이미 주류로 편입된 모양새다.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거나 수동적이고, '민폐'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은 "시대의 흐름에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런 흐름은 한국 뿐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변화"라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양성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담은 작품이 최근 대중 콘텐츠의 트렌드"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가 꼽히고 있다.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1'과 '터미네이터2:오리지널'을 잇는 영화다. 앞선 시리즈에서도 영웅을 탄생시키는 강인한 어머니로 사라 코너(린다 해밀턴)가 묘사됐지만, 이번엔 단순히 '자궁' 제공자에서 나아가 미래를 개척하는 주체성을 가진 리더로 묘사된다.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뿐 아니라 '알라딘'의 쟈스민, '겨울왕국' 시리즈의 엘사와 안나 등 디즈니 공주님들도 왕자님을 기다리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주체적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인물로 변화했다. 디즈니는 마블 시리즈에서도 '캡틴마블'에 이어 안젤리나 졸리를 주연으로 한 '이터널스'도 제작하며 트렌드에 발빠르게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하근찬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전부터 대중문화의 주 소비층은 젊은 여성들이었다"며 "젠더 이슈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들의 취향을 반영한 작품이 늘어나는 건 대중 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녀 갈등을 일으키며 '페미코인'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페미코인은 페미니즘과 비트코인의 합성어로 페미니즘을 자극해 돈벌이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82년생 김지영',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등의 최근 여성 캐릭터들이 주목받았던 작품의 관계자들은 "홍보 전략을 짤 때 젊은 여성층만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작품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라는 의견도 전했다.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내세우는 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리란 관측이다. '젠더 갈등'에 대한 고민은 세계적인 화두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을 담은 작품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
배상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교수는 "'007시리즈'만 보더라도 과거엔 이름도 없이 '본드걸'로 소비됐던 여성 캐릭터들이 지금은 각자의 역할을 갖고 활약한다"며 "양성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최근 '미투'(Me too)를 거치면서 이런 움직임이 더욱 돋보이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양성평등 코드 뿐 아니라 다문화 코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영화들도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에 대한 담론이 이뤄진 후엔 다문화 코드로 관심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