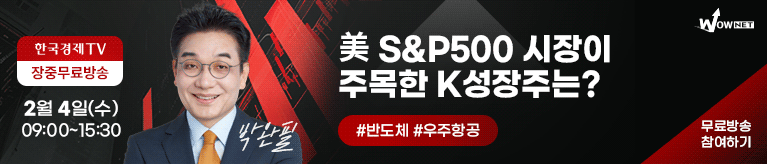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개혁 전도사’로 불린다. 수시로 규제 개혁을 설파하고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개혁 전도사’로 불린다. 수시로 규제 개혁을 설파하고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었다.그런 박 회장이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라고 표현했다. “벤처기업 규제를 풀려고 국회와 정부를 셀 수 없이 찾았지만 대부분 무위로 돌아갔다”고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짙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사업을 준비할 때 공무원에게 절대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는 웬만한 기업인 사이에서는 불문율이다. 법 조항에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드물다. 조항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여지없이 ‘불가’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는 사례가 생겨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사업하면서 가슴 졸여야 하는 현실이다.
"일단 안 된다"는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란 단어를 10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말대로 답은 정해져 있다.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족쇄(규제)’를 풀어주면 된다.
‘전봇대’ ‘손톱 밑 가시’로 상징되는 이전 정부의 규제 개혁 시도처럼 현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서비스 등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한쪽에선 풀고 한쪽에선 조이는’ 일이 지금도 다반사여서다. 법령 대신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기업들을 옥죄는 게 대표적이다.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말께 시행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그렇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이 늘어날 소지가 많아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 개정한 시행령·규칙·고시·지침 등을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보다 규제 강화 내용의 비율이 2.5배 높았다는 조사 결과(한국경제연구원)도 있다.
규제 혁신 성과 점검해야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서울시청(8월 7일)에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를 거론했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행사’(8월 31일)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기대가 잔뜩 커졌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지지층에서 반대여론이 일자 논의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산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물론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에 정부의 입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2일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해 6월로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회의 두 시간을 남겨두고 ‘성과 부족’을 이유로 전격 취소됐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규제 개혁 관련 회의를 추진하다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야말로 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혁명적 접근’이 절실한 때다.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