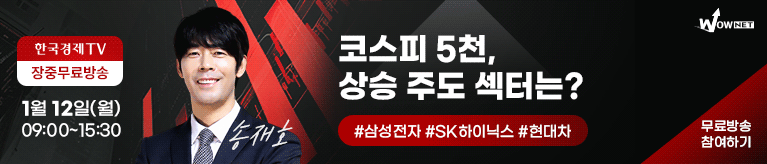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예방접종을 마냥 독려하기보다 접종하러 올 때마다 인도인의 주식인 렌틸콩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접종률이 5%에서 최대 37%까지 올라가더군요.”
“예방접종을 마냥 독려하기보다 접종하러 올 때마다 인도인의 주식인 렌틸콩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접종률이 5%에서 최대 37%까지 올라가더군요.”2019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부부는 14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에서의 빈곤퇴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부부로는 역대 세 번째로 노벨상을 함께 탄 이들은 빈곤 퇴치에 앞장서온 경제학자다. 이들은 경험을 토대로 개발원조 등 일반적 개발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신 그 지역과 문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내 원조·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부는 인도, 아프리카 등 현장에서 ‘무작위대조군연구(RCT)’를 벌였다. 이 연구는 처치를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실험군을 비교해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이론을 현실에 접목해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통상 사람들은 빈곤층이 담배나 마약을 사면서 저축은 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빈곤층은 아예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피상적 비난보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뒤플로 교수는 “빈곤층과 불행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자가 한국식 모델에 대해 묻자 바네르지 교수는 “한국은 기술과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긍정적 결과를 거둔 좋은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저개발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진단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모든 나라가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나는 특정한 발전 모델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고, 뒤플로 교수도 “한국은 좋은 사례지만 국가별로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학적 접근 방법은 빈곤국 발전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힘겹게 사는 이들을 돕는 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발간한 <어려운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미국 프로스포츠팀이 정한 샐러리캡(연봉 상한선)이 선수들의 노력이나 의욕을 꺾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다. 이들은 “초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높은 소득세율은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폭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뒤플로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5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수상자이자 최연소 수상자(만 46세)다. 그만큼 관심이 더 쏠렸다. 바네르지 교수는 이날 새벽 수상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를 설명하며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부부 중 한 명에 대해 콘퍼런스콜을 요청했는데 특별히 여성을 원한다고 했다”며 “나는 자격 미달이라 곧바로 침대로 되돌아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회를 맡은 킴벌리 앨런 MIT 대변인은 “‘바네르지와 그의 부인’ 대신 ‘뒤플로와 그 남편’으로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1999년 지도교수와 박사과정 학생으로 만났으며 2015년 결혼했다. 자녀는 둘이다. 뒤플로 교수는 ‘슈퍼맘으로 살아가는 게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연구만 하다가 일과 가정의 밸런스가 생겨서 좋다”고 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뒤플로 교수는 경제학 분야에 여성이 적은 데 대해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여성이 거의 없어 여성들이 경제학에 접근하는 통로 자체가 좁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들이 경제학 분야가 얼마나 다양하고 흥미로운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뒤플로 교수는 ‘상금으로 뭘 할 것이냐’는 질문에 “라듐을 발견해 여성으로서 처음 노벨상을 탄 마리 퀴리가 상금으로 라듐을 샀다는 내용을 어릴 적 읽었다”며 “공동수상자와 ‘우리의 라듐’이 무엇인지 생각해낼 것”이라고 답했다.
케임브리지=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