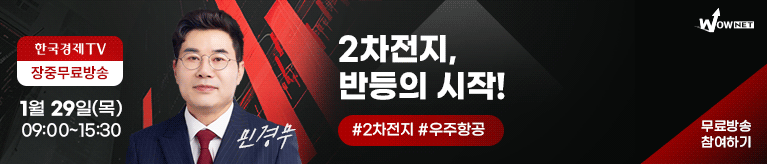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날은 1910년 8월 29일이었다. 다음날 아사히신문에 새 지도 한 장이 실렸다. 일본과 조선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도였다. 이를 본 일본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1886~1912)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도 위의 조선 강역을 검은색으로 칠하며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시 ‘9월 밤의 불평’을 썼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날은 1910년 8월 29일이었다. 다음날 아사히신문에 새 지도 한 장이 실렸다. 일본과 조선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도였다. 이를 본 일본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1886~1912)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도 위의 조선 강역을 검은색으로 칠하며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시 ‘9월 밤의 불평’을 썼다.‘지도 위 이웃의 조선 나라/ 검디검도록/ 먹칠하여 가면서 가을바람 듣는다.// 누가 나에게 저 피스톨이라도 쏘아 주었으면/ 얼마 전 이토처럼/ 죽어나 보여줄 걸.’
그는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저격당한 것을 일깨우며 일제의 침략을 온몸으로 속죄했다. 당시는 천황제를 위태롭게 했다는 죄로 지식인 검거 열풍이 불던 암흑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했다.
제국주의 비판 日시인 필명 삼아
그가 26세로 요절한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백석(白石)은 망국의 운명을 안타까워한 일본 시인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침략국의 일원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는 동지이자 스승으로 여겨졌다. 백석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후 도쿄 아오야마(靑山)학원에서 유학할 때, 이시카와(石川)의 이시(石)를 필명으로 삼고 본명(백기행) 대신 평생 사용했다.
일본문학사에서 이시카와는 메이지 시대의 관념적인 단가(短歌)를 서민의 애환이 깃든 생활시로 확장한 시인으로 꼽힌다. 소재도 도시 서민의 일상이나 고통 받는 사람들의 현실 등으로 다양화했다. <백석시전집>을 엮은 이동순 시인은 “이런 이시카와의 시와 백석의 시는 크게 세 가지 동질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첫째는 고향과 모성의 이미지다. ‘고향 그 사투리 그리워/ 정거장 인파 속으로/ 고향말 들으러가네’ ‘장난하듯 업어 본 엄마/ 너무 가벼워 울다/ 세 걸음을 옮기지 못했네’ 같은 시가 백석의 향토적 모성과 겹쳐진다.
작품 속의 인물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도 공통점이다. 병 앓는 엄마와 고학하는 소년, 궁핍한 목수 부부 등은 백석 시의 떠돌이 장사꾼과 고아 등의 현실과 맞닿는다. 일본의 고답적인 단가를 생활단가로 바꾼 것과 한국 전통 사설시조를 새로운 문법으로 발전시킨 점도 닮았다.
김소월·두보·제임스 조이스까지
백석의 문학적 스승은 한두 명이 아니다. 평북 오산학교 선배 김소월을 비롯해 당나라 시인 두보, 프랑스 시인 프랑시스 잠, 러시아 시인 이사코프스키, 아일랜드 시인·작가 제임스 조이스 등 동서양을 아우른다. 여기에 이시카와의 국경을 초월한 시대정신이 더해져 오늘의 백석 시가 완성됐다.
백석이 오래도록 잊지 못한 시 가운데 이시카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쓴 ‘코코아 한 잔’이 있다. 나라 잃은 백석의 슬픔을 ‘차갑게 식은 코코아 한 잔의 씁쓸한 맛깔’로 어루만져준 시였다.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누기 어려운/ 단 하나의 그 마음을/ 빼앗긴 말 대신에/ 행동으로 말하려는 심정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에게 내던지는 심정을/ 그것은 성실하고 열심한 사람이 늘 갖는 슬픔인 것을.’
한·일 역사 갈등으로 촉발된 경제 전쟁이 100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날선 언어에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간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정신 승리’와 ‘자탄의 한’이 교차한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깊게 연구하는 공부는 뒷전이고 감상적인 한풀이에 매달린다. ‘식민지 시인’ 백석을 눈물짓게 했던 이시카와의 시가 더욱 아프게 읽히는 요즘이다. ‘모든 일의 결말이 어찌 될지 보이는 듯한/ 지금의 이 슬픔은/ 씻어낼 수가 없네.’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