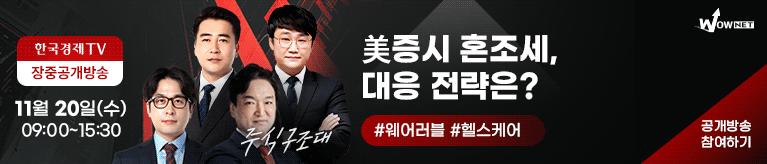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는 예상대로 한국 금융시장과 시장참가자들의 후진성을 보여줬다. 금융회사와 그 직원,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대한 고려 없이 부나방처럼 고수익 상품에 뛰어들었고, 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은행·증권·자산운용사들이 안정성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생략한 채 고위험 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투자위험을 경고하며 반대한 회사 내 상품선정위원을 교체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사례도 드러났다.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크게 하락해 손실과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도 판매를 지속하는 등의 무책임한 행태도 수두룩했다.
은행직원들이 고객 이익보다 자신의 실적을 위해 무분별한 판매경쟁에 뛰어든 정황도 뚜렷하다. 판매액이 클수록 평가가 좋아지는 인사고과시스템 탓에 은행 창구에서는 위험한 파생금융상품이 ‘이자를 더 주는 예금’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잔존 3954개 DLS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에 육박했다.
금감원 발표로 금융사들의 주먹구구식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거액을 집어넣은 투자자들의 책임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고수익 상품’으로 권유받았다지만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이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금융상식이다. 키코·동양그룹·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그간의 많은 사고 때마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은행 추천을 철석같이 믿었다”며 100% 면책만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금융회사의 사기적 수법에는 철퇴가 가해져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투자자 보호를 주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반복적인 사고를 부른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이 누구 못지 않게 크다. 오랜 저금리 추세에서 금융사와 소비자들은 0.1%포인트라도 수익을 더 주는 투자상품을 찾기 마련이고, 자연히 사고의 개연성도 높아진다. 그런데도 ‘소비자 경보’는 작년 8월 이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고 그 사이 DLS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사모상품’이라 사전 허가가 필요 없다지만, 발행잔액의 급증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투자자가 6개월 기준 2%의 수익률을 얻는 동안 금융사에는 4.93%의 수수료가 떨어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품구조도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금융당국은 거의 10년 전부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2012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위도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신설했다. 그러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직 자리 만들기’에 불과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 선진화, 금융산업 비전 등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금융혁신을 부르짖지만 핀테크 육성은 규제에 막혀 기대에 못 미치고 ‘큰 틀’의 금융산업구조개편 논의도 실종된 상태다. 금융을 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대우하고,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