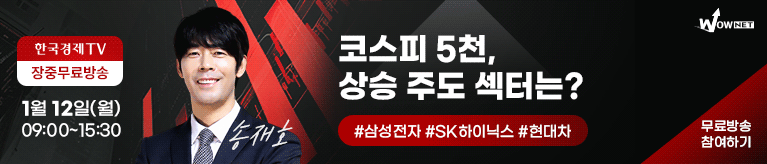국내 완성차 등록대수 2,100만대. 자동차 한 대당 인구 2.46명. 지난해 한국 자동차 시장의 현주소다. 10년 전인 2005년 등록대수가 1,540만대였으니 10년 사이 무려 500만대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늘 성장하는 시장으로 여겨져 왔고, 이를 눈여겨 본 해외 완성차업체들의 진출이 뒤따랐다.
하지만 등록대수 증가율이 3%대에 머문 지는 꽤 오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0%에 달했던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2년 2.3%로 바닥을 찍은 후 지난해 4.3%로 올라섰다.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덕분에 자동차 한 대당 인구는 2.46명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의 1.7명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
그런데 눈여겨 볼 대목은 전체 인구 가운데 운전면허보유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운전면허보유자는 2,990만명에 달한다. 물론 이들 모두가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면허가 운전에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기준 삼으면 자동차 한 대당 인구는 1.4명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주목할 통계는 또 하나 있다.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수입차 포함)는 130만대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128만대로 떨어진 뒤 2014년에는 141만대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 156만대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판매가 떨어진 뒤 다시 반등한 배경은 모두 개별소비세 인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내려준 것도 있지만 한미 FTA 협약에 따라 중대형차 개별소비세율이 해마다 떨어진 점도 보탬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수요 증가를 이끌 만한 요소가 신차 외에는 없어서다. 신규로 자동차 시장에 들어와야 할 20~29세 인구는 669만명으로 30~39세 인구의 765만명보다 적고, 향후 미래 수요를 책임져야 할 10~19세 인구는 569만명에 불과하다(행정자치부 2016년 1월 기준). 다시 말해 수요를 뒷받침 할 젊은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동차회사도 '1인 1대'가 아니라 최근에는 '1인 2대' 보유로 넓히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용도에 따라 여러 대를 보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평일에는 세단을 이용을 권장하고, 주말에는 SUV로 나들이를 유도하는가 하면 가족 모임에 적합한 미니밴도 있으면 좋다는 식이다. 그래야 신차 시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비단 자동차회사만 하는 게 아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 자동차 관련 세금에 막대한 의존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차 판매가 줄면 정부 세수도 감소하는 만큼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간혹 개별소비세 인하가 등장할 때마다 신차 판매에 따른 내수 진작이 아니라 정부의 세수 증가 목적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올해 6월까지 연장된 개별소비세 효과로 국내 완성차가 지난해만큼 판매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오'라는 답을 내놓는다. 세금 인하에 따른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말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자동차세제 자체를 보다 미래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자동차 세금 의존도를 낮추되 이를 대체할 다른 묘수를 찾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한 마디로 자동차세제도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권용주 선임기자 soo4195@autotimes.co.kr
▶ [칼럼]BMW의 솔직함이 가져온 의미
▶ [칼럼]미래를 앞당겨 얻은 10만대
▶ [칼럼]자동차 부식 통계의 2% 부족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