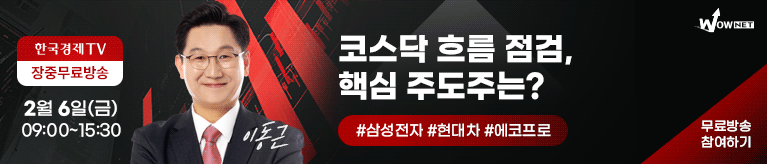바퀴가 달린 걸 흔히 '수레'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정확히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어나르는 용도로 바퀴가 굴러가는 걸 의미한다.
수레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수레가 있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가 건축됐고, 수레가 있어 중국의 만리장성이 건설됐다. 그 만큼 수레는 문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발명품(?)이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늘 기원전에서 흔적을 찾아내곤 한다.
 |
초기 수레는 그저 바퀴만 있을 뿐 사람이 끌었다. 그러다 기르던 가축이 수레를 견인했고, 가축을 대신한 건 18세기 증기기관이었다. 하지만 증기기관은 곧바로 19세기 내연기관(엔진)에 자리를 내줬고, 바퀴도 좌우에서 앞뒤좌우 네 바퀴 또는 앞뒤 두 바퀴로 나날이 진화했다.
엔진을 개발한 후 별도로 움직이는 모든 동력은 엔진이 담당했다. 석유에서 추출한 연료가 엔진 안에서 연소하며 동력을 만들었고, 동력이 바퀴를 회전시키며 움직였다. 동력이 무언가를 돌린다는 점에서 '모터'로 불리기도 했다.
 |
모터를 돌리는 힘이 최근들어서 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고민하던 인류는 엔진과 전기를 겸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고, 전기의 역할을 점차 늘려 순수 전기차도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에너지원이다. 순수 전기로 구동하는 건 좋지만 어디선가 전기를 공급받아야 했다. 또 전기를 넣으려면 발전소 등에서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만큼 100% 친환경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지붕에 비치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구동하는 방식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 부담이 엄청났다.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킬 때 나오는 전기로 구동하려는 노력도 한창이다.
그러나 두 바퀴로 가는 바이크는 달랐다. 흔히 영어 'bike'로 일컬어지는 '탈 것'은 동력의 발생종류에 따라 '모터바이크'와 '순수 바이크'로 나눈다. 모터바이크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엔진이 달려 있는 것이고, 순수 바이크는 우리 말로 '자전거'에 해당한다. 둘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동력을 만들어내는 주체다. 자전거는 움직이는 힘이 네바퀴의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사람의 힘이 동력을 만들기에 충분한 수단으로 오랜 기간 자리해 왔다.
 |
그럼에도 다리에 힘이 없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엔진을 부착한 바이크가 존재하지만 환경면에선 엔진 바이크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이동이 보다 쉽고 환경에 도움되는 수단이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배경이다.
고민하던 사람들은 자전거에 전기동력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사람 힘으로 페달을 돌리다 지치면 전기를 쓰도록 했다. 이 때의 기본 동력은 전기다. 이른바 새로운 두 바퀴 '탈 것'의 등장이다. 바로 만도가 개발해 내놓은 풋루스(Footloose)다. 사람 힘이 직접 바퀴에 전달되는 자전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엔진을 쓰지도 않으니 모터바이크로 볼 수도 없는 애매한(?) '탈 것'인 셈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페달과 뒷바퀴에 체인을 연결하지 않았느냐고.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체인 자전거의 대부분 특허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특허를 피하고, 나아가 순수 우리 기술로 새로운 틈새를 개척하려는 목표로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개발한 게 풋루스다.
 |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 간단하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해두면 된다. 그리고 타고 싶을 때 밖으로 나가면 된다. 속도 제어는 전기 공급을 통해 조절한다. 언덕을 오를 때는 전기를 많이 쓰고, 내려올 때는 안쓴다. 페달 또한 힘이 있으면 돌리고, 없으면 놔둔다. 그래도 배터리에 전기가 남아 있는 한 굴러간다.
충전한 전력만으로 최장 45㎞ 거리를 갈 수 있으며, 빨리 가고자 할 때는 속도를 시속 25㎞까지 낼 수 있다. 전력을 모두 쓰면 자전거는 멈춘다. 그 때는 페달을 돌려도 소용없다. 무조건 전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서지 않으려면 페달을 계속 돌려야 한다. 전력을 모두 사용하면 들고 가야 한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 이동수단으로 개발했다.
 |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개념 자체가 새로웠다. 그래서 '풋루스'를 개발한 만도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보관이 쉽도록 접이기능도 적용했고, 다양한 색상을 선보여 패션에 어울리도록 유도했다. 풋루스 전용 오프라인 카페도 열었다. 그래야 흔히 눈에 보이는 체인 자전거와 차별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야 450만 원에 달하는 판매가격도 거부감이 없다고 여겼다. 이른바 새로운 탈 것에 대한 '가치 높이기'다.
걸림돌도 있다. 사람 힘으로 직접 바퀴를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다. 어떤 동력을 바퀴에 쓰느냐가 논란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다. "풋루스, 넌 자전거냐 자동차냐? 정부는 응답하라".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 개발했지만 정작 자전거가 아니라니 이게 왠말인가.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 시계 한계를 뛰어 넘은 F1 시계, '태그호이어'
▶ 자동차와 레고의 공통점, '어른들의 장난감'
▶ 리얼레이싱3, 모바일로 즐기는 쾌속 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