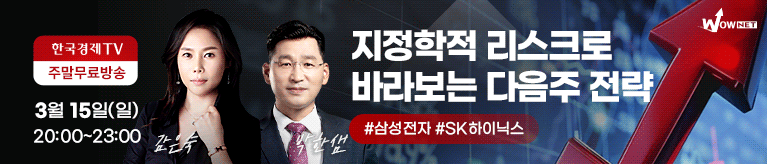GM과 혼다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료전지 사업 제휴에 나섰다.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탱크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연료전기차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나누기 위해서다. 연간 생산량이 380만대에 불과한 혼다로선 930만대에 이르는 GM의 몸집이 필요했고, GM은 혼다의 독자적인 연료전지 기술이 탐났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토요타와 BMW가 연료전지 개발에 손을 잡았다. 토요타와 BMW가 약속을 하자마자 닛산과 다임러, 포드가 연료전지 결혼을 발표했다.
 |
이처럼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는 연료전지 분야에서 제휴가 활발한 이유는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홀로 개발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하이브리드에 활용되는 기술의 일부가 연료전지로 이관돼 비용이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대당 1억원 넘는 완성차 가격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업들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제휴선을 경쟁적으로 늘린 것도 대당 가격을 낮춰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일본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혼다는 2015년 이전에 한화 5,000만원 정도에 판매될 연료전지차 상용화를 계획 중이며, 토요타는 1990년대부터 연료전지차 연구를 수행해 왔다. GM도 선행연구를 통해 연료전지 기술을 축적해왔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휴 등으로 손을 잡을 때 현대차는 아직 관망세다. 제휴선으로 남은 곳으로 폭스바겐이 꼽히지만 양사의 경쟁 관계로 볼 때 대승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즉, 연료전지차를 공동 개발해도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경쟁이 불가피함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제휴에 관해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한다. 하이브리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연료전지도 현대기아차 홀로 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가 홀로 연료전지 시스템 독자 개발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독자 행보를 걸었던 하이브리드도 별 다른 재미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토요타 특허 그물망을 피해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을 내놨지만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독자적 양산을 선택했다. 투싼ix 연료전지차에 100㎾급 연료전지 시스템과 2탱크 수소저장 시스템(700기압)을 탑재했다. 동력계는 100㎾급 전기모터, 에너지 저장장치는 24㎾급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다. 1회 충전으로 최대 594㎞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휘발유로 환산하면 연료효율이 ℓ당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NEDC 유럽 연비 시험 기준).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탁월한 저온 시동성을 확보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최고 시속은 160㎞,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 시간은 12.5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순수한 물 외에 배출물질이 없어 하이브리드, 전기차, 클린디젤 등 친환경 차 중에서도 환경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 스택 개발 등 독자 기술력, 양산 기술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현대차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1997년 출시 이후 하이브리드 시장을 선도한 것처럼 이번 신차로 수소연료전지차 시장 선점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료전지차의 글로벌 상용화는 쉽지 않다. 수소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로 시장을 선점한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하이브리드는 촘촘하게 형성된 주유소를 통해 화석연료를 넣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별도 충전소 건립이 필요하다. 한 때 미국이 정부 주도로 연료전지차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가 비용 문제로 손 든 것도 결국 충전 인프라 때문이다. 전기차를 넘어 현실적인 무공해 대안이지만 인프라는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셈이다.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그 사이 손을 잡은 기업도 연료전지 양산으로 제품을 쏟아낼 것이다. 이 경우 경쟁이 불가피하고, 선점 효과는 기대만큼 얻지 못하게 된다. 결국 현대기아차도 누군가와 손을 잡아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독자행보의 여유를 보일 수 있지만 제휴 기업들이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에 돌입하면 오히려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독자행보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는 것도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 타이어 생산, 상반기 5,000만 본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