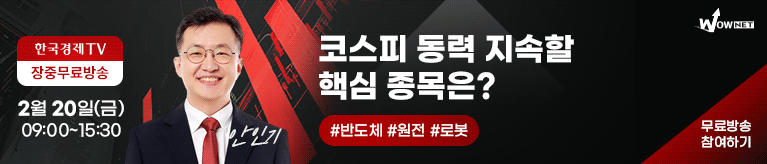美 "중국은 경쟁자"…성장저지 총력 압박
일시적 대외 악재로 보고 대처해선 안돼
현승윤 이사대우·독자서비스국장
[ 현승윤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다. 시간이 갈수록 싸움판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의 ‘숫자’를 밀고 당기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세계 무역질서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다. 중국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아예 탈퇴하겠다는 각오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다. 시간이 갈수록 싸움판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의 ‘숫자’를 밀고 당기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세계 무역질서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다. 중국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아예 탈퇴하겠다는 각오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 관대한 시각을 보여왔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중국인의 삶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것도 이런 기대의 표출이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세계 최대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미국은 ‘그 당시 결정이 최악의 판단이었다’며 후회하고 있다. 무역 흑자는커녕 막대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엄청난 돈이 중국에 빨려 들어갔다. 이 돈이 중국인의 생활 개선에 쓰였다면 그나마 위안으로라도 삼을 텐데, 사회주의 국가 건설 재원으로 대거 투입돼 공산당 독재가 되레 강화됐다는 게 미국의 요즘 생각이다.
중국은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확정된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년이 되는 2049년 미국을 넘어서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했다. 2014년에는 중국의 옛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신(新)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주도 세계 금융질서에 맞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2015년 설립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자유무역 국가가 아닌 중국을 WTO에 받아준 것이 실수였다”고 토로했다. 중국은 각종 비관세 장벽을 견고하게 쳐놓은 비(非)자유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WTO 회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환율 조작과 수출보조금으로 해외 판매를 늘리고 내수소비를 억제해 확보한 막대한 저축(국내총처분가능소득의 40% 이상)을 국내외 자본 투자와 군사비 지출에 쓰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세계 경제 발전의 동반자’라기보다는 ‘체제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 시장경제라는 효율 좋은 무기를 장착했을 뿐 본질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이다.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강대국이 되는 순간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전쟁에서 노골적으로 싸움을 거는 트럼프 정부가 노리는 것은 ‘중국 성장률 떨어뜨리기’다. 연 6%를 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지 않으면 미국은 머지않아 추월당한다. 핵심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제조업무역정책국장은 저서와 강연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줄이면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군비확장 감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겠지만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 고(高)성장이 무너지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도 무너진다. 1989년 베이징 톈안먼 시위 이후 중국은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대신 국민 생활수준을 높여주겠다는 ‘대타협’을 했다. 경제성장이 위축되면 시위 사태가 다시 번질 수 있다. 미국에 강경 대처하는 게 내부 불만 단속에도 유리하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중국 공산군의 대장정(大長征) 출발지인 장시성 간저우시 위두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장정에 착수했다”며 각오를 다졌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졌다. 무력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무역질서가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위기다. 만약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일시적인 ‘대외 악재’나 시간이 지나면 걷히는 ‘불확실성’ 정도로 본다면 정말 게으른 판단이다.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