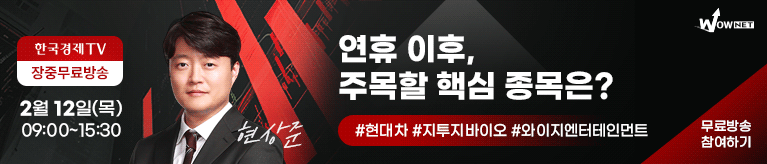[ 고두현 기자 ]
 20년 전만 해도 첨단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 기업 독무대였다. 소니와 샤프 등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이 세계 시장의 80%를 석권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대만의 AOU 등에 밀려 퇴조하기 시작했다.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은 2006년 16%까지 떨어졌다.
20년 전만 해도 첨단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 기업 독무대였다. 소니와 샤프 등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이 세계 시장의 80%를 석권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대만의 AOU 등에 밀려 퇴조하기 시작했다.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은 2006년 16%까지 떨어졌다.삼성에 반도체 기술을 전수했던 샤프는 2016년 대만 기업에 넘어갔다. 엊그제는 일본 최대 LCD 패널 제조업체인 재팬디스플레이가 대만 업체들에 팔렸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충격을 받았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일본 원조(元祖) 기업들은 거의 전멸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검색 엔진의 원조’ 야후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다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야후는 2000년대 초까지 세계 최고 검색 엔진이었다. 야후라는 이름이 웹 서핑의 보통명사로 자리 잡을 정도였다. 그러나 새로운 강자 구글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금융 부문에서도 잔혹사가 이어졌다. 세계를 주름잡던 리먼브러더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돼 158년 역사를 스스로 접고 말았다. ‘포천 500대 기업’ 중 156위였던 베어스턴스는 JP모간체이스에 인수됐다. 아무리 강한 기업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들이다.
경영학자들은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을 따라잡지 못해 몰락한 기업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혁신가의 딜레마》를 쓴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은 디지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아날로그에 집착하다 망한 코닥을 예로 들며 “기존 고객이 원하는 ‘존속성 기술’에 사로잡혀 새 고객이 요구하는 ‘와해성 기술’을 간과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지적한 ‘기업 몰락의 5단계’도 참고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불행한 기업은 성공에 따른 자만심에 젖어 원칙 없이 많은 욕심을 내고,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며, 막연히 구원자를 찾아 헤매다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를 밟는다.
기업만 그런 게 아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언제든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승리에 취해 우쭐거리면 낭패 보기 쉽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끝없는 ‘무상(無償) 포퓰리즘’에 젖었다가 온 국민이 굶주리는 ‘국가 몰락’ 상태에 빠졌다.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