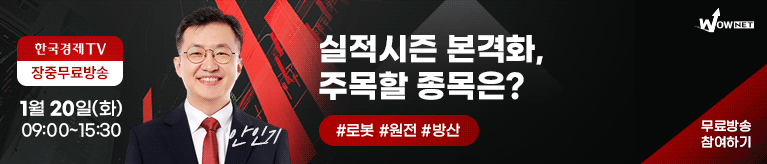'영업정지' 초강수뒀다
업계 강력 반발에 '경징계' 매듭
조진형 증권부 기자
[ 조진형 기자 ]
 “승자는 없었다. 상처만 남았다.” 일단락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온 촌평이다.
“승자는 없었다. 상처만 남았다.” 일단락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온 촌평이다.이번 사건은 주연과 조연, 스토리 모든 게 독특했다. ‘발행어음 1호’ 초대형 투자은행(IB)과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이 출연하고, 총수익스와프(TRS)와 특수목적회사(SPC) 같은 복잡한 선진금융 기법이 등장했다. 진행 과정도 흥미로웠다. 금융감독원이 초대형 IB에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꺼내들자 금융투자업계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안팎의 지적이 쏟아지자 금감원은 석 달 가까이 칼을 다시 갈아야 했다.
초대형 IB에 발행어음을 허용한 건 모험자본 투자를 늘리라는 취지였다. 이를 개인 대출에 활용하는 건 잘못이라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 한투증권은 개인 대출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다른 펀드나 신탁처럼 SPC와 TRS를 활용한 통상적인 기업 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의도적으로 판을 짜놓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SK실트론 주식 매입자금을 대출해줬다고 봤다. 이번 거래를 ‘사실상’의 개인 대출이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의미를 담아 자본시장법을 해석했다. 마지막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그 정황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마다 차환되는 해당 SPC의 유동화증권 조달금리가 연 1.66%(1차)에서 연 1.95%(2차)로 올라 마진이 줄어들자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발행어음 자금으로 갈아탔다는 것이다. 최 회장으로부터 받는 금리는 연 3.4%로 고정돼 있다.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펀드·신탁도 마찬가지로 개인 대출이 금지돼 있지만 금감원은 “사모 투자자들은 (한투증권과 달리) 실제 차주를 몰랐다”면서 면죄부를 줬다. 제재심의위는 결국 ‘기관경고’란 다소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사건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준비도 덜 된 채 철퇴를 끄집어낸 데 기겁하고 있다. 개인 대출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첫 사례인 만큼 잘 타이르고 지도하면 될 일을 왜 완장 차고 두들겨 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가해자만 있을 뿐 피해자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다. △성장기업펀드 후순위 불공정 투자 혐의(무혐의) △펀드 운용 부당 지원 혐의(기관주의) △베트남 법인 부당 신용공여 혐의(기관주의) 등은 더 가벼운 징계로 결론 났다.
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자본시장법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으로 창의적 금융을 막고 있는 데다 시장 변화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이번 한투증권 위반 안건 중에서도 기관경고를 받은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에 대한 과태료는 5000만원인 반면 기관주의에 그친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관련 과징금은 45억원 안팎에 이른다.
시장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모호한 자본시장법과 시장을 등진 ‘불통(不通) 금감원’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금융위원회가 빚어낸 ‘촌극’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금융당국은 생각해봐야 한다.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