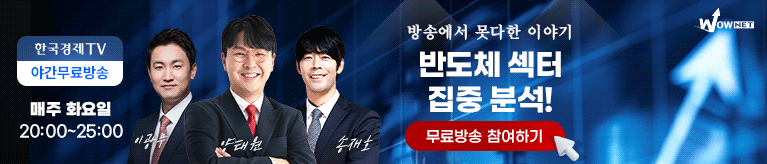자유시장 지지 "민간 돈 갖다 쓰는 정부지출은 손실 낳아"
 지난 호에서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미치는 ‘구축효과’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지출은 민간의 자금을 정부가 가져와 쓰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손실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입주의자들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정부가 단기적으로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맞선다. 두 주장의 역사를 살펴보자.
지난 호에서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미치는 ‘구축효과’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지출은 민간의 자금을 정부가 가져와 쓰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손실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입주의자들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정부가 단기적으로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맞선다. 두 주장의 역사를 살펴보자.케인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시장 vs 정부’ 논쟁은 ‘애덤 스미스(이후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vs 케인스’ 논쟁이라고 할 만하다. 애덤 스미스 전통으로 이어져온 고전학파의 기본 원리는 시장의 자동 조절 메커니즘에 맡겨 두자는 생각에 기반한다. 시장은 불균형과 균형을 오가면서 자동으로 경기를 조절한다는 주장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유 방임(laissez faire)’과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개념은 시장주의자들의 키워드다.
여기에 맞선 경제학자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1929년 대공황기에 케인스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모두 죽는다’는 말로 정부 개입을 옹호했다. 정부가 불황기의 유효수요 부족을 시장이 자동조절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정을 지출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앉아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 케인스는 ‘저축의 역설(저축을 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경기가 죽는다)’을 주장할 만큼 소비를 중시하였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케인스의 개입주의가 주류경제학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반격
케인스 학파의 번영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1970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케인스 학파의 입장은 곤란해졌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실업이 늘었다. 경기 불황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올리더라도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케인스 학파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이러한 케인스 학파의 논리를 깨뜨려버렸다. 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겼고, 이는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때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의 대처 정부는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등의 조언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통화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 그러자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함께 오르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사라지면서 경제가 안정화되었다.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이에크는 “통화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붐이 일어나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결국 불황 속 인플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개입을 반대했다. ‘구축효과’도 프리드먼이 케인스 학파를 반격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었다.
과연 정부는 완벽한가?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케인스 학파는 시장 vs 정부, 구축효과 vs 승수효과, ‘작은 정부 vs 큰 정부’ 등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놓고 끊임없이 논쟁했다. 과연 정부는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구원자일까? 아니면 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논쟁은 경제학자 사이에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가 침체돼 수요가 감소함에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
모든 개인이 절약을 해 저축을 증가시키면 경제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해 오히려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