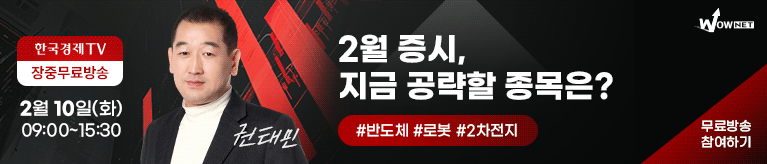음원 앱에 수많은 최신곡들 빠르게 뜨고 쉽게 사라져
"명곡으로 숙성할 시간 없어"
[ 김희경 기자 ]

“그 시절 영국엔 두 명의 여왕이 있었다.”
이 표현을 빌리면 현재 한국엔 한 명의 여왕이 존재한다. 전설이 된 영국 록 밴드 ‘퀸(Queen)’이다. 1970~1980년대 세계 음악계에 군림한 이 여왕은 올해 국내 스크린에서 다시 화려하게 살아났다.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이들의 음악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는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다. 국내 개봉 음악 영화 중 역대 1위 기록이다.
영화에선 퀸의 음악에 대한 혹평이 나온다. 실제로 퀸은 활동 기간 내내 혹평에 시달렸다. 기존의 록음악 양식을 따르지 않은, 곡 길이가 6분이나 되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담은 4집이 나왔을 때 특히 그랬다. 하지만 이들을 발굴해낸 것은 전문가나 평론가가 아니라 ‘대중’이었다. 영화처럼 퀸이 첫 앨범부터 인기를 얻은 건 아니다. 서서히 입소문이 나다가 ‘보헤미안 랩소디’로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다.
퀸 열풍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같은 콘텐츠 과잉 시대에 과연 대중은 ‘제2의 퀸’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퀸의 음악은 그 자체로 탁월했다. 하지만 음악팬들이 그 숨겨진 보석을 찾아 확산하지 않았더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시장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퀸은 1~2집만 내고 활동을 접었거나 일부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여왕’을 탄생시킨 이런 시스템은 오늘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콘텐츠들 사이에서 ‘제2의 퀸’을 변별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유명 해외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을 주최해 온 현대카드의 정태영 대표(부회장)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곡을 만드는 것은 뮤지션이지만 명곡을 만드는 것은 시장’이라는 말이 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만들고 퀸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었지만 곡들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자신들도 몰랐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은 곡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명곡으로 숙성될 시간 없이 끝나버리고 만다.”
음원이 발표되면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앱(응용프로그램) 상단의 ‘최신음악’ 코너에 오른다. 다수의 대중에게 빠르게 노출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다른 앨범들에 밀려 상단에서 금방 사라진다. 앨범이 나오자마자 차트 순위에 오르지 못하면 발견되기 쉽지 않다. 새로 나온 노래를 일일이 찾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노래가 알려지지 않으면 신인들은 무대에 오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퀸이 관객과 호흡하기 위해 손발로 박자를 맞추며 시작하는 ‘위 윌 록 유(We Will Rock You)’를 만든 것은 오늘날 신인들에겐 꿈같은 얘기다.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연간 8만 종 이상의 책이 나오고 있다. 출판시장이 정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이다. 그러나 독서율, 서점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 풍요 속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대중이 더 큰 갈증을 느끼고 콘텐츠를 외면해 버린 결과다. 문화계 사람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최병환 CJ CGV 대표는 지난 6일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고객들의 눈을 어떻게 스크린 위에 잡아 놓을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압권은 마지막 ‘라이브 에이드(Live Aid)’ 공연 장면이다. 1985년 영국 웸블리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15억 명의 시청자와 관객이 함께한 공연이다. 이를 재현한 장면을 보며 영화 관객들은 강렬한 비트와 함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숨겨진 보석을 찾아냈을 때의 환희처럼 오랜만에 ‘진짜’와 마주한 기쁨이지 않을까. 최근 많은 기업이 이런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콘텐츠를 선별하는 큐레이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제2의 퀸을 찾아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기계에 의존하기보다 펄떡이는 대중의 심장 박동에 먼저 귀 기울이는 일일 것이다.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