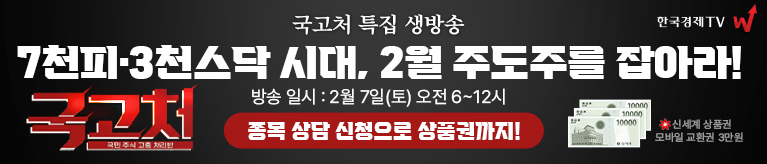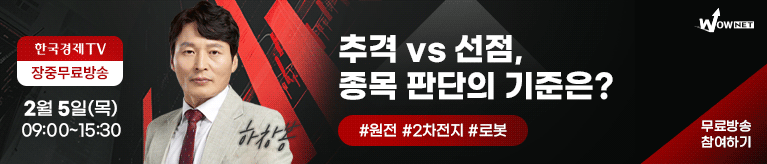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길 것이며, 법제화는 이익을 공유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법제화 자체가 또 다른 규제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보듯이 정부가 권하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가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말이 ‘자율’이지 ‘타율’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이익공유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내 업체와의 이익공유가 자칫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모든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익공유제가 몰고 올 악영향이다. 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은 공정하지 못하니 나눠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초과이익은 기업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나서는 ‘동기’요, 성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퍼스트무버’ 경쟁을 벌이는 이유도 ‘선점을 통한 초과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혁신의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라”고 하면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이 줄고, 과실을 나눠 가지려는 기업만 잔뜩 늘어날 게 뻔하다. 아무도 혁신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런 점에서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정부가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기모순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규제개혁이 더딘 마당에 혁신의 동기와 보상까지 사라지면 혁신성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