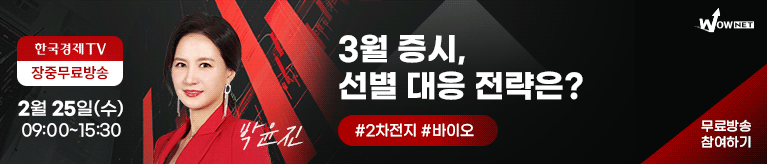해외 한 가전회사는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 파산한 일화가 있다. 초기에 잘 팔렸지만, 대대로 물려줄 만큼 내구성이 좋아 재구매가 필요없었던 탓이다.
해외 한 가전회사는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 파산한 일화가 있다. 초기에 잘 팔렸지만, 대대로 물려줄 만큼 내구성이 좋아 재구매가 필요없었던 탓이다.1970년대 가정에 19인치 흑백TV, 200L짜리 냉장고가 있으면 넉넉한 축에 속했다. 요즘은 신혼부부도 50인치 TV, 1000L 냉장고가 낯설지 않다. 이런 내구재는 그래도 10년은 너끈히 쓴다.
이에 비해 스마트폰은 2년 이상 쓰는 경우가 드물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OECD 1위면서 교체주기는 평균 15.6개월로 가장 짧다. 독일(32.5개월)에 비해선 절반도 안 된다. 대당 100만원을 호가하는 최신폰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 소비는 아닐 것이다. 속칭 ‘폰부심(최신 폰+자부심)’ 탓인가.
스마트폰을 2년 넘게 쓰면 속도 저하, 고장, 방전 등 불편이 많다는 게 이용자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제조사들이 일부러 수명을 짧게 만들어 자주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 애널리스트 분석에 의하면 아이폰은 교체주기가 6개월 길어지면 애플 매출이 17% 줄어든다고 한다. 반대로 교체주기가 짧아지면 수익이 커질 것이다.
제조사는 물론 전문가들도 음모론을 부인한다. 스마트폰은 ‘손안의 PC’로 불릴 만큼 예민한 기기다. 가끔 쓰는 가전제품과 달리 24시간 내내 켜놓고 수시로 쓴다. 떨어뜨릴 때도 많다. 그만큼 고장 가능성이 커진다. 배터리는 쓸수록 충전력이 떨어지는 반면 앱은 최신 운영체계(OS)와 내장 반도체에 맞춰 업그레이드돼 속도 저하가 숙명이다.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있다. 우선 배터리 일체형이 등장하면서 수리 또는 배터리 교환이 쉽지 않다. 한 번 수리하는 데 보통 30만~40만원이 들어 차라리 바꾸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 참에 애플이 ‘고의 성능 저하’ 논란에 휘말려 일파만파다. 애플은 배터리가 낡은 구형 아이폰(아이폰6, 6s, SE, 7)의 갑작스러운 꺼짐을 방지하기 위해 OS 업데이트 때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 결과 꺼짐 현상은 해소됐지만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충성도 높은 아이폰 마니아들은 “사전 공지도 없이 성능을 저하시켜 최신폰 구매를 유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삼성·LG전자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참에 구형 스마트폰 성능이 저하되면 배터리부터 바꿔보는 게 경제적임을 알게 됐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