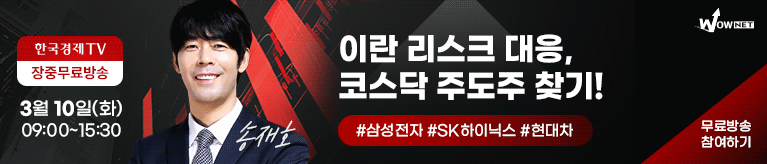정부 '감축 지시' 의도는
"예비율 떨어져 수급 불안 땐 탈원전 논리 약해질까" 우려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급전지시’를 통해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을 통제하고 있지만 지난달 발전설비 예비율이 30% 이상일 정도로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다. 2011년 9월 ‘전력대란’이 빚어진 뒤 정부가 발전 물량을 대거 늘려왔기 때문이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발전설비 예비율은 평균 34%를 기록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7~8월)에 발전설비 예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2003년 7월(30.3%) 이후 14년 만이다. 발전설비 예비율은 전체 발전설비 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최대 전력수요(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의 비중을 말한다. 발전설비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발전설비 예비율은 평균 34%를 기록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7~8월)에 발전설비 예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2003년 7월(30.3%) 이후 14년 만이다. 발전설비 예비율은 전체 발전설비 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최대 전력수요(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의 비중을 말한다. 발전설비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실제 가동 중인 발전설비 용량만으로 계산하는 전력 예비율(공급 예비율)도 지난 7월21일 12.3%가 최저였다. 지난해 여름 전력 예비율이 한때 8.5%(8월12일)까지 떨어진 것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 통상 전력 예비율이 두 자릿수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올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력수요는 예년과 비슷하다. 정부가 급전지시를 내린 지난달 21일 최대 전력수요는 84.59GW였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지난해 8월12일의 85.18GW보다 오히려 낮다. 그럼에도 정부는 7월21일 2000개 기업에 총 2508㎿를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감축 요구 물량은 과거에 비해 두 배나 많았다. 전력수요가 더 많았던 작년 8월12일 급전지시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동 중인 발전설비 용량과 최대 전력수요 차이(예비전력)가 5GW 미만이면 정부는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들어간다. 또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