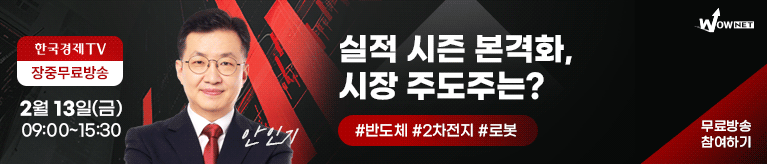문재인 대통령이 '협치 정치력' 발휘해야
서정환 정치부 차장 ceoseo@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출범 초기 파격 인사에 ‘국민 눈높이’의 탈권위·소통 행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지난주에는 다자 외교의 첫 시험무대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덕에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출범 초기 파격 인사에 ‘국민 눈높이’의 탈권위·소통 행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지난주에는 다자 외교의 첫 시험무대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덕에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하지만 ‘문재인표 개혁’은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새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장관 임명이 끝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첫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기준으로 정부 구성이 역대 ‘꼴찌’를 기록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야3당이 정면충돌하면서 국회가 멈춰섰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야당의 반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소통하겠다”고 손을 내밀었고, 야당도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협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 기댄 채 야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대결 프레임’에 갇힌 형국이다.
여야는 정국 파행을 놓고 네 탓 공방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라고 야당을 공격하고 있고, 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독주’라고 반박하고 있다. ‘연정’과 ‘통합’ 논의가 쑥 들어간 지 오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놓고 제3당인 국민의당과 정면충돌하면서 여야의 대립 구도가 확연해졌다. 빌미를 제공한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국민의당을 공격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다. 이로 인해 여야의 경계를 넘어 민주당(120석)과 선택적 협력을 해온 국민의당(40석)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사라졌다. 국민의당은 그간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들어가며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했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동참했다. 국민의당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권으로선 갑갑한 노릇이다.
대표적 다당제 국가인 일본에서 공명당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작은 거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공명당 의석은 중의원 전체 475석 가운데 35석, 참의원 242석 중 25석에 불과하다. 아베 정권에 공명당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2012년 말 아베 2차 내각 출범 때 자민당은 중의원에서는 과반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선 115석에 그쳤다. 공명당과의 연대로 참의원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근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 2000일을 넘은 역대 3위의 장수 총리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각종 안건을 놓고 수시로 만났다. 장소도 총리 공관뿐 아니라 도쿄 시내 식당 등 가리지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관련 법 개정,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 원전 재가동 등 굵직한 정책은 양 대표 간 협의를 거쳐 나왔다.
국민의당에선 “다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무슨 협치냐”고 반문한다. 다당제 아래에서 협치는 필수다. 공통 공약을 놓고 사전에 머리를 맞대는 정책 연대가 시급하다. 국민의당은 정책 노선이나 지역 기반에서 민주당과 공통점이 많다. 초록은 동색이라 하지 않았는가. 국민의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서정환 정치부 차장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