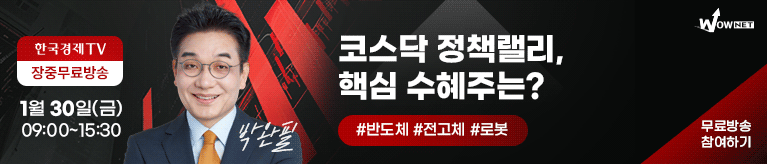선거가 끝났다. 과거엔 외투를 입고 12월 겨울에 치르던 대선이다.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장미선거’로 보였을지 몰라도 또 다른 유권자들에겐 미세먼지만 가득한 선거였다. 철 바꾼 선거였으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취임식 팡파르도 없다. 철 잃은 5월 투표는 유권자의 다른 시각에 따라 장미만 보이기도 했고 미세먼지만 보이기도 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조합인 장미와 미세먼지를 하나의 창조적 예술로 묶어내려는 ‘국민통합’ 노력이야말로 새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1 국정과제인지 모른다.
선거가 끝났다. 과거엔 외투를 입고 12월 겨울에 치르던 대선이다.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장미선거’로 보였을지 몰라도 또 다른 유권자들에겐 미세먼지만 가득한 선거였다. 철 바꾼 선거였으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취임식 팡파르도 없다. 철 잃은 5월 투표는 유권자의 다른 시각에 따라 장미만 보이기도 했고 미세먼지만 보이기도 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조합인 장미와 미세먼지를 하나의 창조적 예술로 묶어내려는 ‘국민통합’ 노력이야말로 새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1 국정과제인지 모른다.어느 나라든 선거운동기간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기간이다. 표에 혈안이 된 후보들은 이 기간 중 현실성 없는 ‘헛공약(公約)’을 양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백미는 “모든 비(非)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호였다. 과연 가능한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해묵은 난제 중 난제다. 그러니 비정규직 문제가 단골 선거이슈로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정규직이 흘리는 눈물은 먹이를 잡아먹으며 흘리는 ‘악어의 눈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퇴출시킨 노노(勞勞) 갈등은 이 문제의 위선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사례였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에 비(非)자 하나가 추가된 단어다.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둘은 ‘샴쌍둥이 단어’인 것이다. 그러니 말장난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정규직을 없애는 것이다.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자동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없앤다는 건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화하자는 것과 같다. 혁명적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이상할 것도 없다. 미국 등 서구제국의 일자리는 사실상 모두가 임시직, 즉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거나 오히려 어색한 게 서구 고용시장의 모습이다.
모든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와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동의어 반복’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유연성=모든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쉬운 해고’는 사실상 동의어인 것이다. 노조가 발끈하며 저항하는 대목이다. 모든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는 균등하고 정의로운 기회제공사회로 이어진다. 좌파정권이 추구해온 고용평등사회가 그것이다. 정규직을 과보호해 온 법체계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과감히 개혁하는 일이야말로 ‘적폐해소’라는 구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일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고 행복추구의 근간이다.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새롭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라는 구호는 그래서 만들어진 공약임에 틀림없지만 그 실현성과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할 좋은 대안인가에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우선 81만이라는 숫자는 60만에 가까운 우리 군대보다도 20만이나 더 많다. 연봉 3000만원짜리 일자리 80만개를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 인건비만으로 매년 24조원이 든다. 80만 추가 공공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인프라 또한 필수불가결이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추정조차 어렵다. ‘작은 정부’ 추구는 아직도 유효한 모든 선진제국의 정책목표다.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다 망해버린 그리스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선거는 마무리됐다. 장(場)이 끝난 후에도 ‘공약(空約)장사’에 집착하는 건 온당치 않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어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탄핵과 철 잃은 선거에 묻혀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이제는 우물 바깥세상을 내다 볼 때다.
양봉진 < 세종대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