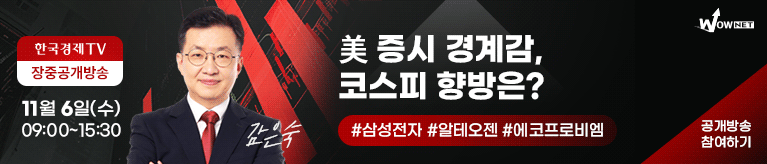삶을 바꿀 창의적 기술 못 내놓는 이유
학과 칸막이 치우고 융합교육 강화해야
박수용 < 서강대 교수·컴퓨터공학 >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는 2009년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기술 관련 산업 전시회다. 올해도 200여개국, 2200여개 기업,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해 가히 ‘정보기술(IT) 올림픽’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는 2009년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기술 관련 산업 전시회다. 올해도 200여개국, 2200여개 기업,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해 가히 ‘정보기술(IT) 올림픽’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올해도 작년에 이어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제 중국은 IT산업 분야에서만큼은 값싼 공산품 제조국이 아니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오른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삼성, LG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100여개 중소기업이 각기 새 기술을 선보였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한국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세상에 던지는 의미있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좀 더 세련된 모양의 모바일폰을 출시하고, 5G로 대변되는 초고속 통신망을 상용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런 기술들로 우리 사회를, 우리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지에 관한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해외 기업들은 자체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바일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함으로써 모든 자동차가 연결돼 자율주행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에 대한 비전과 메시지를 보여줬다. 세계적 신용카드사인 마스타카드의 ‘Don’t pay, just pass it(결제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이란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미래 지급결제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보여줬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만난 국내 한 기업 임원과의 대화 중에, 한국 IT기업들이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은 우수하나 창의적인 서비스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대학의 경직된 교육 탓도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똑똑한 것 같기는 한데 토론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동안 주어진 문제를 풀고, 해외 기술 동향을 보고 따라가고, 사례를 답습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육 문제야 입시제도라는 국가적인 큰 벽에 막혀서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학에서만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번 MWC에서 선보인 미래를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은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 무인자동차 및 로봇 기술 등이다. 이런 기술들은 지금은 칸막이식으로 교육하는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항공공학, 심리학, 통계학 등을 두루 연계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대학교육에서 학과라는 울타리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로운 전공 혹은 분야를 학생들이 4년 내내 마음대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드론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 무인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4년간 학과를 초월해 관련 학과목을 자유로이 수강하면서 프로젝트도 경험해 졸업할 때쯤에는 MWC에 자신의 졸업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어느 대학에서인가는 길러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대학이나 학과 이름과 커리큘럼이 비슷한 그런 교육체계에서는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나오길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이, 교수들이 결단을 내리고 우리 교육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대학이, 모든 학생이 그런 교육을 하고 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어디에선가는 좀 더 다른, 좀 더 자유로운 융합 학문을 교육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우리 미래의 희망을 키워 갈 수 있지 않을까. 식사시간이라서 그랬던지 썰렁하기만 했던 평창올림픽 전시관이 잊혀지지 않는다.
박수용 < 서강대 교수·컴퓨터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