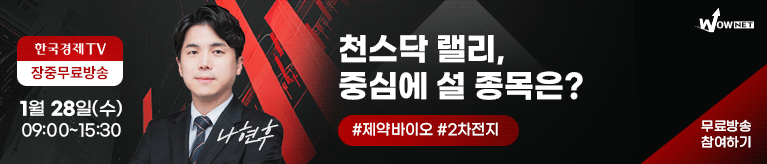선진국에서는 기업 경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어떤 장치들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자.
‘1주 1의결권’의 장단점을 토론해보자.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인정하고 있다.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대주주에게 차등 의결권(dual class stock)을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례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세계적 투자회사 벅셔해서웨이는 버핏 회장에게 일반주주의 200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줄 테니 투자에만 전념해달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경영권 보장을 약화시키는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 주만으로도 거부권 가능한 ‘황금주’
 미국에서는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만연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했고 1994년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1주 1의결권’이 원칙이며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일부 제한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만연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했고 1994년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1주 1의결권’이 원칙이며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일부 제한하기도 한다.페이스북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20%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고 있다. 창업자의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황금주는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의 주요한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뜻한다. 극단적으로는 단 1주만으로도 적대적 M&A 등 특정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84년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됐다. 민영화 이후에도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경영진을 견제하려는 게 취지였다.
구글·포드 등도 차등의결권 도입
선진국에서는 주당 의결권이 제로(0)이거나 반대로 수십, 수백 개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도 우선주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구글은 2004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결정했다. A종 보통주식에는 ‘1주 1의결권’을 부여하고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등에게는 ‘1주 10의결권’의 B종 주식을 발행했다. 당신 구글은 창업주 서신을 통해 “단기 이익을 좇는 월스트리트식 경영 간섭을 받지 않고 장기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설명했다. 포드자동차는 7%의 지분을 소유한 포드 일가에 40%의 복수의결권을 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요 상장사 500대 기업 중 허쉬, 컴캐스트 등 30여 곳이 복수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결권 배분이 미국보다 더 자유롭다. 유럽연합(EU) 상위 500대 기업 중 브리티시에어웨이(영국) 폭스바겐(독일) 미쉐린(프랑스) 칼스버그(덴마크) 피아트(이탈리아) 에릭슨(스웨덴) 등 101곳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상장회사의 66%가 차등의결권을 행사한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상장사의 51%, 41%가 차등의결주를 발행했다.
‘1주 1의결권’은 항상 옳을까?
흔히 정치는 ‘1인 1표’, 경제는 ‘1주 1표’라고 한다. 정치·경제적 주권의 평등을 상징하는 말이다. 주주평등 원칙이라는 점에서는 ‘1인 1의결권’이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정치와는 달리 경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 1주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대주주의 주식은 경영권 확보 성격이 강하고, 일반주주의 주식은 투자 성격이 강하다. 글로벌 투기자금은 경영권 침해와 단기이익 성격이 짙다. 기업에 대한 충성도 측면에서 대주주와 투기적 주주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보유 기간이 길수록 주당 의결권을 많이 주자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프랑스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주당 2개의 의결권을 준다.
차등의결권이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효율적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면서 정작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차등의결권이 주주평등 침해, 자본흐름 왜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인 1의결권’을 맹신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