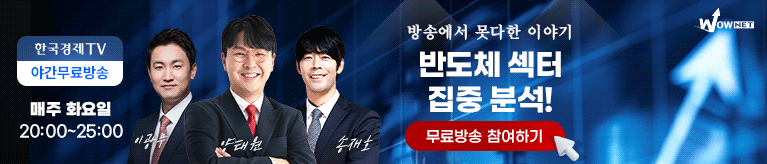홍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가는 비행기에는 온통 흑인과 인도인, 백인뿐이었고 동양 여자는 나 혼자였다. 그제야 아주 멀리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비행기 안에는 독특한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곱슬머리와 반들반들한 검은 피부,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줄루어와 인도어가 영어와 뒤섞여 오감을 자극하고 있었다. 솔직히 두려웠다. 요하네스버그는 하루에 120명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도시라는데 나는 혼자였다. 관광을 포기하고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묵고 다음날 더반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도저히 길거리를 돌아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입증됐다. 더반의 시장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반 영화제에서 만난 폴란드 감독과 함께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키 큰 흑인 청년이 홀연히 나타나 백주에 감독의 비디오를 빼앗아 달아났다. 감독은 큰 덩치에 만만치 않은 기운을 가진 여성이었다. 죽어라 달아나는 그 흑인 청년을 기어이 쫓아가 실랑이 끝에 비디오를 찾았고 청년은 도망갔다. 나는 사색이 돼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표정으로 무심히 지나쳤다. 아프리카는 혼돈의 땅이었다.
 잠비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본 빅토리아 폭포는 세계 최고 폭포답게 2㎞ 밖에서까지 물이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둥 치는 연기’라는 뜻의 빅토리아 폭포는 무려 108m 높이에서 떨어져 내린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낙차가 55m이니 거의 두 배나 되는 셈이다. 폭포 구경을 한 뒤에는 나무로 깎은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거나, 호텔 마당의 해먹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 나는 헤밍웨이가 왜 아프리카를 사랑했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아프리카는 자연이 고함을 치고, 대지가 포효하는 거친 야성을 품고 있었다.
잠비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본 빅토리아 폭포는 세계 최고 폭포답게 2㎞ 밖에서까지 물이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둥 치는 연기’라는 뜻의 빅토리아 폭포는 무려 108m 높이에서 떨어져 내린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낙차가 55m이니 거의 두 배나 되는 셈이다. 폭포 구경을 한 뒤에는 나무로 깎은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거나, 호텔 마당의 해먹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 나는 헤밍웨이가 왜 아프리카를 사랑했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아프리카는 자연이 고함을 치고, 대지가 포효하는 거친 야성을 품고 있었다. 자연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사람들의 삶은 피폐했다. 호텔 바깥을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아프리카의 붉은 땅에서 아이도 짐승도 모두 맨발로 비포장도로를 뛰어다녔다. 시장에 나가 보니 다양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천막 안에서는 머리를 깎고 있었고, 노상 전화기 앞에는 전화 한 번 쓰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아공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체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뽑아주면 그
자연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사람들의 삶은 피폐했다. 호텔 바깥을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아프리카의 붉은 땅에서 아이도 짐승도 모두 맨발로 비포장도로를 뛰어다녔다. 시장에 나가 보니 다양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천막 안에서는 머리를 깎고 있었고, 노상 전화기 앞에는 전화 한 번 쓰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아공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체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뽑아주면 그 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는 카메라 렌즈만 보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쫓아와서 혹시 사진 찍었냐며 따지는데 말이다.
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는 카메라 렌즈만 보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쫓아와서 혹시 사진 찍었냐며 따지는데 말이다.더반 영화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케이프타운을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프리카를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 같았다. 인도인 프로그래머에게 가이드해 줄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10년이 넘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디노와 그의 친구들과의 인연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디노는 별명이 다이노소어, 즉 공룡이었는데 190㎝를 넘는 장신의 백인 사내였다. 그에게는 인도나 흑인 친구들이 많았다. 남아공에 인도인이 많은 것은 사탕수수 노동자로 일한 인도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4700개의 개인 소유 와인 농장이 존재하는 와인 대국 중 하나다. 오염 없는 자연의 세례를 받아서인지 남아공산 와인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케이프타운 북동쪽으로 40㎞ 떨어진 스텔렌보스는 많은 남아프리카의 와인 농원 중에서도 아담하고 수려한 풍광을 뽐낸다.
남아공은 4700개의 개인 소유 와인 농장이 존재하는 와인 대국 중 하나다. 오염 없는 자연의 세례를 받아서인지 남아공산 와인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케이프타운 북동쪽으로 40㎞ 떨어진 스텔렌보스는 많은 남아프리카의 와인 농원 중에서도 아담하고 수려한 풍광을 뽐낸다. 농원으로 향하는 길은 타조 농장과 나지막한 유럽식의 집들이 뒤섞여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냈다. 근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인 농원인 스피어(Spier)란 곳에 들렀다. 마당에는 줄루족 흑인 여자들이 마주 앉아 남아프리카 전통의 구슬 공예를 하고 있고, 마음씨 좋게 생긴 흑인 아저씨는 손으로 돌리는 나무 비행기 장난감을 팔고 있었다.
농원으로 향하는 길은 타조 농장과 나지막한 유럽식의 집들이 뒤섞여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냈다. 근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인 농원인 스피어(Spier)란 곳에 들렀다. 마당에는 줄루족 흑인 여자들이 마주 앉아 남아프리카 전통의 구슬 공예를 하고 있고, 마음씨 좋게 생긴 흑인 아저씨는 손으로 돌리는 나무 비행기 장난감을 팔고 있었다. 와이너리에서는 여러 종류의 와인을 시음할 수도 있고, 농장 안 식당에서 그윽한 와인 한잔과 함께 뷔페식 식사를 할 수도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파는 피노타지(Pinotage)는 오직 남아프리카에서만 존재하는 희귀 품종의 와인이었다. 바텐더의 설명을 들으며 피노타지 시음을 했는데, 과일맛이 진한 것이 몹시나 기품 있는 와인이었다. 게다가 와인 한 병값이 고작 4000~5000원 정도이니 수지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와이너리에서는 여러 종류의 와인을 시음할 수도 있고, 농장 안 식당에서 그윽한 와인 한잔과 함께 뷔페식 식사를 할 수도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파는 피노타지(Pinotage)는 오직 남아프리카에서만 존재하는 희귀 품종의 와인이었다. 바텐더의 설명을 들으며 피노타지 시음을 했는데, 과일맛이 진한 것이 몹시나 기품 있는 와인이었다. 게다가 와인 한 병값이 고작 4000~5000원 정도이니 수지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익어가는 가을 햇살 속에 여유있게 포도 농원의 한편에 앉아 소풍 나온 아이처럼 와인의 맛을 즐겼다. 와인 농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나는 여행에서 사귄 남아프리카 친구들과 함께 케이프타운을 상징하는 테이블 마운틴에 올랐다. 산 정상이 마치 책상처럼 평평해서 붙여진 테이블 마운틴은 ‘쥬라기 공원’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익어가는 가을 햇살 속에 여유있게 포도 농원의 한편에 앉아 소풍 나온 아이처럼 와인의 맛을 즐겼다. 와인 농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나는 여행에서 사귄 남아프리카 친구들과 함께 케이프타운을 상징하는 테이블 마운틴에 올랐다. 산 정상이 마치 책상처럼 평평해서 붙여진 테이블 마운틴은 ‘쥬라기 공원’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이윽고 밤이 되자 주변에는 항구를 감싼 야경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빛의 제전, 100만개의 촛불에 둘러싸인 금빛 스타디움의 정상에 오른 것 같았다. 친구들은 그곳까지 유리잔을 가지고 와서 페어뷰라는 와인을 따라주며, 한국까지의 무사 귀환을 빌어 줬다. 나는 이들을 위해 미리 연어 초밥을 손수 만들어서 함께 먹었다. 이윽고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다는 기쁨이 몰려왔다.
이윽고 밤이 되자 주변에는 항구를 감싼 야경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빛의 제전, 100만개의 촛불에 둘러싸인 금빛 스타디움의 정상에 오른 것 같았다. 친구들은 그곳까지 유리잔을 가지고 와서 페어뷰라는 와인을 따라주며, 한국까지의 무사 귀환을 빌어 줬다. 나는 이들을 위해 미리 연어 초밥을 손수 만들어서 함께 먹었다. 이윽고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다는 기쁨이 몰려왔다. 나는 여전히 아프리카를 잘 모르지만, 이제 한 가지는 알게 됐다. 백인들의 눈높이와 서사로 쓰인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순전한 판타지일 뿐. 여기 남아프리카는 백인들이 아무리 오래 지배를 해도, 서구식 이성과 합리성의 침범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검은 대지와 검은 인간 모두에게 축복을 전하고 싶었다. 검은 것은 아름다웠다.
나는 여전히 아프리카를 잘 모르지만, 이제 한 가지는 알게 됐다. 백인들의 눈높이와 서사로 쓰인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순전한 판타지일 뿐. 여기 남아프리카는 백인들이 아무리 오래 지배를 해도, 서구식 이성과 합리성의 침범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검은 대지와 검은 인간 모두에게 축복을 전하고 싶었다. 검은 것은 아름다웠다. 심영섭 영화평론가 chinablue9@hanmail.net
심영섭 영화평론가 chinablue9@hanmail.netⓒ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