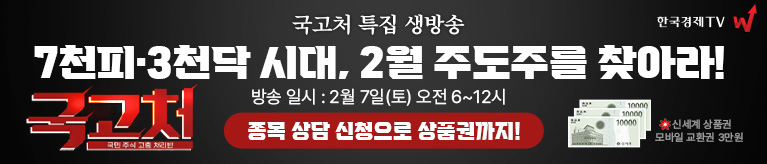미국 경기 회복으로 신흥국 기업 실적 개선 기대
인프라 관련 미국 기업·저평가된 중국 증시 등 주목
[ 송형석 / 이현진 / 김우섭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15일. 이른 아침부터 주요 은행과 증권사 일선 지점에 투자자들의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향후 3년간 매년 세 차례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예고에 따라 앞으로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에 묶여 있던 글로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주가 더 간다
 이번 발표의 파급효과를 점치려면 우선 지난해 말 미국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난 올해의 자산별 재테크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미국 주식(S&P500 기준) 수익률은 10.4%에 달했다. 글로벌 국채 수익률(2.1%)의 다섯 배 수준이다.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란 전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옮긴 결과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도 따라 오르게 돼 있다. 기존 채권 투자자가 금리 차이만큼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Fed가 밝힌 스케줄대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채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향후 3년간 금리 변화로만 2%가 넘는 손실을 입는다.
이번 발표의 파급효과를 점치려면 우선 지난해 말 미국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난 올해의 자산별 재테크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미국 주식(S&P500 기준) 수익률은 10.4%에 달했다. 글로벌 국채 수익률(2.1%)의 다섯 배 수준이다.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란 전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옮긴 결과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도 따라 오르게 돼 있다. 기존 채권 투자자가 금리 차이만큼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Fed가 밝힌 스케줄대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채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향후 3년간 금리 변화로만 2%가 넘는 손실을 입는다.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와 미국 주식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파른 인상 속도 자체가 미국 경제의 호조 지속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주식 중에는 이미 몸값이 오른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유망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근수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장은 “최근 미국 상장사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너무 오르지 않았느냐는 목소리가 힘을 잃고 있다”며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인프라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 주식도 싸다
지난해 연말 첫 금리 인상 때와 다른 것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식에 대한 평가다. 미국 금리와 관련된 전통적인 공식은 ‘미국 금리 인상=신흥국 증시 하락’이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화 대비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바뀌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신흥국 증시에서 돈을 뺀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Fed가 매년 네 차례 이상 가파른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세 차례 인상은 당초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순매도 규모는 33억원에 불과했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에 힘입어 신흥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오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미국 주식이 비싸다고 판단한 글로벌 ‘큰손’ 자금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투자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이장호 하나UBS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강해졌다”며 “신흥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늘고 실적도 좋아지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투자처는 중국 증시다. 올해 중국 본토 주식(상하이종합 기준) 수익률은 -10.8%다.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거친 만큼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하다는 조언이다. 호재도 많다. 중국 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면서 시중 자금이 증시로 움직이고 있다. 산업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 중국 생산자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요 업종의 공급 과잉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펀드나 개별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서툰 투자자라면 주가연계증권(ELS)을 활용할 만하다. ELS는 주요국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금융상품으로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오르는 국면엔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송형석/이현진/김우섭 기자 click@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