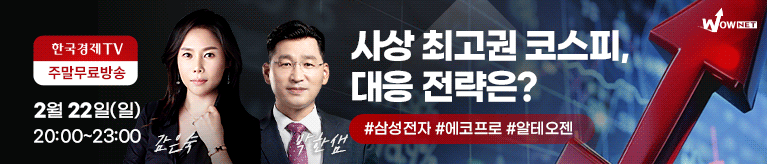[ 양병훈 기자 ]
 겉으로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과 말투는 상냥하지만 이기적인 사람. 그중 한 사람이 친구나 가족이어야 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를 고를 것이다. 소설가 정이현 씨(44·사진)가 보기에 요즘은 후자처럼 상냥한 얼굴을 한 폭력이 만연한 시대다. 그는 “예의 바른 악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놓으면 손바닥이 칼날에 쓱 베여 있다”고 말한다.
겉으로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과 말투는 상냥하지만 이기적인 사람. 그중 한 사람이 친구나 가족이어야 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를 고를 것이다. 소설가 정이현 씨(44·사진)가 보기에 요즘은 후자처럼 상냥한 얼굴을 한 폭력이 만연한 시대다. 그는 “예의 바른 악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놓으면 손바닥이 칼날에 쓱 베여 있다”고 말한다.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로 유명한 정씨가 새 단편집 《상냥한 폭력의 시대》(문학과지성사)를 냈다. 정씨가 단편소설집을 낸 건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2013년 겨울부터 문예지 등을 통해 발표한 일곱 편을 묶었다. 수록작에는 하나같이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절대로 나쁜 말은 않지만 실제로는 칼날처럼 쓱 베는’, 이른바 ‘상냥한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정씨는 “누구나 상냥한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수록작 ‘안나’는 남편이 의사인 전업주부 주인공이 우연히 옛 지인과 재회하는 얘기다. 주인공은 고급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이고 지인은 그 유치원의 보조교사다. 주인공은 자녀교육 문제로 보조교사를 따로 만나 대화하며 가까워진다. 그러나 무심한 듯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툭툭 던지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한다. 이런 행동의 바탕에는 과거 지인에게 좋아하는 남자를 빼앗긴 걸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다. 마침내 그는 지인이 유치원에서 작은 사고를 치자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 유치원에서 쫓아내는 데 앞장선다.
‘우리 안의 천사’에서 주인공 ‘미지’는 애완견 수술비 문제로 동거남과 싸워 결국 따로 살기로 결심한다. 이때 동거남의 이복형이 나타나 “자산가인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나눠 갖자”고 천연덕스럽게 제안한다. 미지는 주저하는 동거남의 등을 은근히 떠민다. 이복형과 미지는 웃는 얼굴로 무서운 얘기를 하는 상냥한 폭력의 가해자다.
정씨는 “지금 한국 사회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지만 알고 보면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모멸감, 화,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상처가 덮개처럼 쌓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상냥한 폭력의 네트워크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을 그려 보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