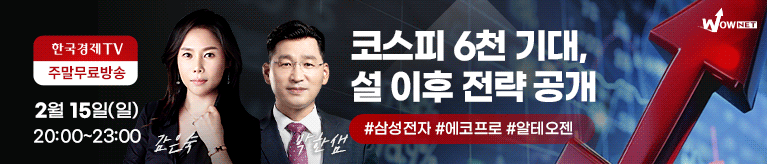세상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시끄럽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모금하는 재단이 이게 다가 아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가려져 있을 뿐이다.
세상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시끄럽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모금하는 재단이 이게 다가 아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가려져 있을 뿐이다.게임문화재단이 그중 하나다. 2008년 2월 설립된 게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게임회사들이 기부한 106억원을 모태로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 그런데 최근 기금이 고갈됐다. 문화부는 다시 업체에 기금을 요청했고, 게임업체들은 돈을 낼 수도 안 낼 수도 없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게임업계가 고민에 빠진 이유는 이 재단의 운영에 게임업체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데, 돈을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재단의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도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즉, 돈을 또 내자니 회사 내부를 설득할 명분이 약하고, 돈을 안 내자니 문체부의 보복이 두렵다. 게임 규제라는, 매출을 반 토막 낼 수 있는 무기를 쥐고 있는데 어떤 간 큰 게임사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만사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문체부가 기금을 다시 조성하려면 먼저 게임문화재단의 그간 활동을 평가하고, 게임업계 및 학계 전반의 공감을 획득한 뒤 기금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8년간 게임문화재단의 성과는 거의 없다.
8년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국민의 게임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하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은 여전한 사회적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게임문화재단이 문체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민간단체라는 간판에도 게임문화재단의 예산 계획 수립과 운영에 돈을 낸 게임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래서야 돈을 내기는커녕 냈던 돈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최근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위기 상황을 반영해 106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한 자금이다. 그런데 이면에서 문체부는 게임사로부터 100억원을 모금하려 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임문화재단이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문체부는 기금 모금과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반대로 관변단체라면 그 운영 예산은 정부에서 나와야 한다. 106억원의 모금액과 106억원의 추경액, 공교롭게 금액도 같다.
위정현 < 중앙대 교수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