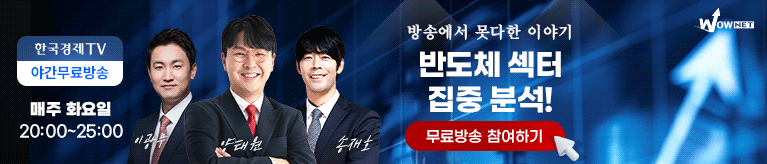불거진 '자율협약 무용론'
[ 김일규 기자 ]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회생을 모색하던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자율협약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율협약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처음부터 한진해운 신규 지원은 어렵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자율협약은 법적 강제력 없이 채권단과 채무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협약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 등이 채권단의 채무상환 유예 등을 얻어내기 위해 신청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법정관리 절차보다는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구조조정 기업이 선호하는 편이다.
채권단은 그동안 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여신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했다. 요주의 여신은 고정 및 회수 의문(워크아웃)이나 추정손실(법정관리) 여신과 비교해 충당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용이하다. STX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이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자율협약 형태의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해선 끝까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해외 선주와 사채권자 등의 �誰?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협약을 통해 여러 부실기업에 수조원을 신규 지원해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진 뒤 아무래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을 통해 회생한 기업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부실기업의 연명 수단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