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두현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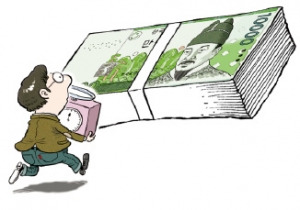 영화 ‘조선명탐정 : 사라진 놉의 딸’은 이렇게 시작한다. ‘정조 19년(1795년) 조선에선 은광 채굴이 금지돼 모든 은은 왜로부터 들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함량이 떨어지는 불량 은이 다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불량 은괴가 나도는 이유는 뭔가. 화폐 액면가와 제조비용의 차이 때문이다. 중세 봉건영주(시뇨르)들이 금화에 구리 같은 불순물을 섞어 차익을 남긴 데서 유래한 ‘시뇨리지’가 바로 이것이다.
영화 ‘조선명탐정 : 사라진 놉의 딸’은 이렇게 시작한다. ‘정조 19년(1795년) 조선에선 은광 채굴이 금지돼 모든 은은 왜로부터 들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함량이 떨어지는 불량 은이 다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불량 은괴가 나도는 이유는 뭔가. 화폐 액면가와 제조비용의 차이 때문이다. 중세 봉건영주(시뇨르)들이 금화에 구리 같은 불순물을 섞어 차익을 남긴 데서 유래한 ‘시뇨리지’가 바로 이것이다.시뇨리지 효과는 독점적 발권력이 있는 국가가 갖는다. 한국은행이 5만원짜리 지폐를 찍어내면서 1000원어치의 종이와 잉크를 썼다면 시뇨리지 효과는 4만9000원이다. 지폐보다 동전은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든다. 지난해에는 동전 제조비용이 540억원으로 전년(408억원)보다 32.4%나 늘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500원짜리 주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 38원이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역(逆)시뇨리지’다. 동전을 녹여 구리 등을 뽑는 범죄도 많았다. 동전의 재료는 구리 65%와 아연 35%로 구성돼 있다. 원자재값 부담이 자꾸 커지자 한국은행은 2006년부터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워 만든 새 10원짜리 동전을 발행했다. 재료비를 줄이긴 했으나 시뇨리지로 볼 때는 여전히 고비용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올해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금 결제시 거스름돈을 동전이 아니라 별도의 개인 카드로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금 5000원을 내고 45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 500원을 받지 않고 가상계좌와 연계된 선불카드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동전을 쓸 일이 거의 없어진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현금 없는 사회’와 비슷한 개념인데 2020년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모양이다. 스웨덴의 현금 결제비중은 20% 안팎으로 여타 국가의 평균(75%)보다 55%포인트나 낮다. 현금 대신 신용, 직불카드와 금융거래 앱을 사용한다. 이런 사례를 활용해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우리도 못 할 게 없다.
차제에 화폐 단위를 조절하는 디노미네이션(통화단위 절하)까지 고려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000원을 1환으로 조절해 달러와 비슷하게 맞추는 식이다. 그러면 국가 간의 통화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전 제조비용 또한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