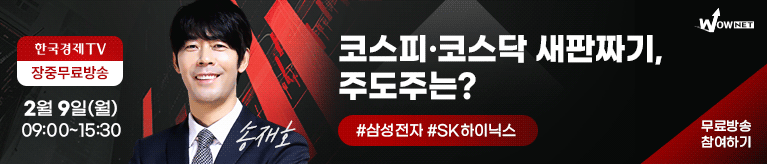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설립한 공기업(지방공기업법 1조)을 가리킨다. 도시공사, 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각종 재단 등이 있다. 하지만 목적과 달리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이 난립하고 부실화해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기업은 작년 말 현재 398개, 총부채는 73조6000억원(부채비율 70.7%)에 달한다. 속성상 한번 설립되면 기능을 다해도 좀체 사라지는 법이 없다.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미흡하지만 의미가 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인천시는 기능이 비슷한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을 합치는 등 9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안양 부천 등 기초 도시공사가 없는 지자체들과 협업해 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이런 시도가 성과를 내면 다른 시·도들도 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기존 공기업이 버젓이 있어도 비슷한 기관을 또 새로 만들도록 조장한 게 공기업이 난립하는 가장 큰 이유다.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들에겐 개발이 곧 표와 직결되고, 논공행상에도 필요하다는 식이다. 부실화해도 임기만 끝나면 그만이니 기초단체까지 지방공기업을 앞다퉈 세우겠다고 달려드는 것이다. 주민 혈세가 무서운 줄 아는 지자체장이라면 자발적으로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 아니 새로 만들어내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