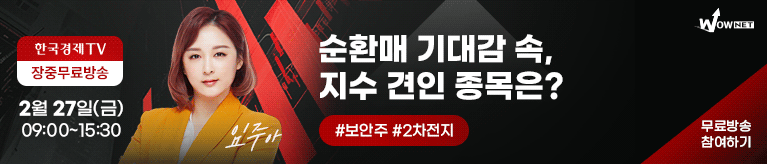회사 앞 김밥천국이 얼마 전 문을 닫았다. 그 옆 편의점에 물어보니 주인이 장사하기 싫어 그만뒀단다. 장사가 잘되는데 문을 닫았을까.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고작 3000~5000원짜리 밥집마저 폐업할 정도는 아닐 텐데.
회사 앞 김밥천국이 얼마 전 문을 닫았다. 그 옆 편의점에 물어보니 주인이 장사하기 싫어 그만뒀단다. 장사가 잘되는데 문을 닫았을까.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고작 3000~5000원짜리 밥집마저 폐업할 정도는 아닐 텐데.답은 맞은편 식당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인근 종로학원 학원생 감소로 주변 상권의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상인들 말로는 한때 2000명에 달했던 학생 수가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재수생 감소, 쉬운 수능, 대졸 취업난 등의 결과다. 듣고 보니 식당마다 북적이던 학생들이 요즘 눈에 띄게 줄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줄어 재수생 고시원은 직장인용 원룸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다.
경기침체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말로만 걱정하던 저출산 쇼크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어서다. 메르스야 곧 지나가겠지만 저출산은 두고두고 견뎌야 할 만성질환이다.
만18세 20년새 32만명 줄어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만 18세 인구는 2000년 82만명, 올해 65만명에서 5년 뒤인 2020년엔 50만명에 겨우 턱걸이다. 20년 새 32만명 급감하는 것이다. 현재 대입 정원이 56만명인데 대학 진학률이 70%면 지원자가 40만명도 안 된다. 더 심각한 게 군대다. 병역자원(만 18세 남자)은 2010년 37만명에서 2020년 25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이들이 전원 입대해도 60만 병력은 불가능하다.
취학아동(만 6세) 감소는 이미 현실이다. 2000년 71만명에서 2011년 사상 최저인 44만3000명에 그쳤다. 합계출산율 사상 최저인 ‘1.08명 쇼크’ 때 태어난 2005년생이다. 그 뒤에도 출산율이 1.1~1.3명을 맴돌고 있어 학교가 남아돌 판이다.
불과 5년 뒤면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다. 저출산 쓰나미에 대비해 사회시스템을 서둘러 개조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얼기설기 계획만 있을 뿐, 저항은 거세고 실천은 지지부진하다. 민간은 어떻게든 적응하겠지만 경직된 공공섹터는 기득권의 덫에 걸려 답이 잘 안 보인다.
저출산 해법, 생산성 제고뿐
교육부가 내년 교사 정원 2300명 감축 계획을 밝히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거꾸로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명분은 공교육 정상화인데 교사만 늘리면 정상화될까. 국방부는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선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120만 병력을 내세운 감축불가론도 거세다. 병력이 줄면 자동으로 줄여야 할 별(장성) 숫자는 2030년에나 검토 대상이란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변변한 자원도 없는 한국의 유일한 강점은 풍부한 인적자원이었다. 앞으로는 그 강점이 약점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왕성하게 일할 30~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 하강곡선과 오버랩된다. 내년부�?15~64세 생산가능인구까지 처음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8년 500만명에서 2020년 1100만명이 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 연금, 노동, 교육, 부동산 등이 다 그렇다.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개혁 당하게 마련이다. 인구구조는 누가 어찌해 볼 도리도 없지 않은가. 저출산 쇼크 극복은 생산성 제고 외엔 달리 해법이 없다. 그것이 선진국 문턱을 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