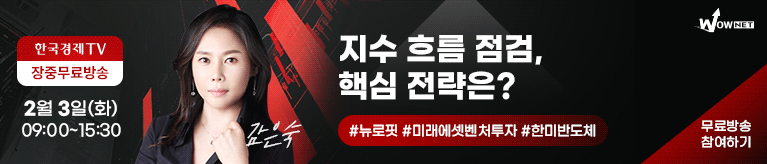법안 모두 비용추계서 없어 '졸속 입법' 지적
사태 진정되면 무관심…심사도 제대로 안해
[ 박종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슷한 메르스 후속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전염병 확산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실적 쌓기용 유사 법안 발의가 대부분이란 지적이다.

○“국회 입법 통해 문제해결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15일 현재 14건의 메르스 관련 법안이 쌓여 있다. 지난달 26일 첫 발의 이후 20일간 발의된 것이다. 법안을 검토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이 터지면 주로 강제로 구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거나 벌금을 올리는 수준의 개정안들이 올라온다”며 “메르스 대책의 경우 보건당국 위주의 대응이 시급한데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확산 뒤 나온 법안 대부분은 정부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리자와 의료기관 등의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이 중첩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상당 부분 법률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수준이라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산하에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12일에 발의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법안은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두도록 했다. 시·도별 감염병 관리 담당 부처가 겹친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의 법안은 격리자 생활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복된다.
○유명무실한 공청회·페이고 원칙
법안을 만들기 전 실시하는 공청회나 ‘페이고(pay-go·법안 제출 때 재원 조달 방안 의무화)’ 원칙을 준수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번 ‘메르스법’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14개 법안 중 2개 법안만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을 뿐이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주로 보건당국이 시급하게 시행령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아직 구성 초기단계여서 정부가 특위에 입법 요청을 해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보건당국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이 제각기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결국 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메르스대책 관련 입법 창구가 메르스대책위원회인지 복지위인지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19대 국회 개원 후 18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14건은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1960년대에 처음 제정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2003년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2009년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역할을 못했다.
신종플루 대란을 겪었던 18대 국회에서도 각종 예산 지원책과 법안들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계류된 뒤 자동 폐기수순을 밟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