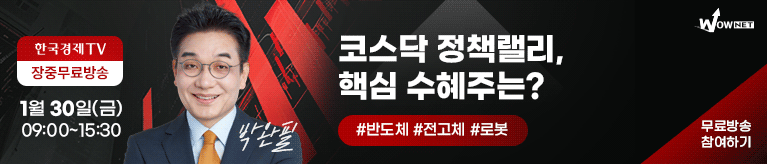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수출경쟁력 약화 막으려는
일본정부 저금리 정책이
주식·부동산 가격 폭등 불러
버블붕괴 이후 부실금융 발생
일본정부 100조엔 투입했지만
재정만 나빠지고 불황 초래

1985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호텔.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등 이른바 경제 선진국 G5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유명한 플라자협정(Plaza Accord)이다.
 당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실 경상수지 적자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방만한 통화팽창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Fed)은 1980년대 들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금리를 인상하자 미 달러화 가치가 크게 올랐다. 그 결과 글로벌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달러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실 경상수지 적자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방만한 통화팽창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Fed)은 1980년대 들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금리를 인상하자 미 달러화 가치가 크게 올랐다. 그 결과 글로벌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달러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합의한 것이다.플라자협정 이후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엔·달러 환율은 1985년 달러당 260엔에서 1987년 123엔까지 상승했다. 엔화가치 상승으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엔화가치 상승 효과를 상쇄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86년 1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재할인금리를 5%에서 2.5%로 낮추며 엔화를 풀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통화량이 평균 10.5%씩 증가했다. 투자와 소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투자와 소비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1988년도 경제성장률이 7.1%를 기록했다. 대호황이었다.
돈이 넘쳐났다. 가계와 기업은 낮은 금리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해외자산도 적극적으로 매입했다. 소니는 컬럼비아, 미쓰비시는 록펠러센터를 인수하는 등 미국 부동산과 기업들을 인수한 것도 이때다. 해외자산 매입에는 엔화 강세의 힘도 컸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닛케이지수가 1986년 1월 말 13,000에서 1989년 39,000까지 세 배나 뛰었고, 1989년 상업 지역 땅값이 1985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뛰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토지와 주식가격 시가총액 증가액은 명목 GDP를 넘어서기도 했다. 1989년 명목GDP가 410.1조엔이었는데 그해 토지가격이 321.6조엔, 주식가격은 194.8조엔 각각 증가해 총 516.4조엔 늘었다.
1987년부터 버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는 알아채지 못했다. 1986~198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0.5%에 불과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89년 5월 물가가 3%로 급등하자 그때서야 돈이 너무 풀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금리를 올렸다. 1989년 4월부터 1년3개월간 기준금리를 2.5%에서 6.0%까지 무려 두 배 이상 인상했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정 규모로 규제하는 대출총량규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관련 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많은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러자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다. 1989년 말 39,000이었던 닛케이지수가 1992년 15,000 이하로 60%가량 하락했다. 1990년대 중반 주가가 약간 상승했으나 2001년 3월 12,000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은 그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1~1998년 80% 하락했다.
자연히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했다.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해 부실 금융기관이 늘어났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억제하고 기대출금을 회수하자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해 새로운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1995년 부실채권비율은 75%에 달해 처음 문제가 발생한 1991년에 비해 35%포인트 증가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995년 17조4000억엔에서 1996년 41조9000억엔으로 1년 동안 약 2.4배 늘었다. 실업률도 1991년 2.1%에서 2000년 말 4.7%로 증가했다. 버블이 붕괴되면서 불황이 찾아온 것이다.
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10차례에 걸쳐 100조엔 이상을 투입했다.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구제금융도 제공했다. 그러나 불황은 치유되지 않았다. 재정상태만 악화됐다. 국가채무가 증가해 GDP 대비 100% 이상이나 됐다.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역시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은행이 6%였던 기준금리를 1991년 4.5%, 1992년 3.25%, 1993~1994년 1.75%, 1995~2000년 0.5%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재정 투입과 저금리정책으로 돈을 풀어 불황을 치유하려 했지만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졌다.
오스트리안 경기변동 이론에 따르면 인위적인 호황 뒤에 따르는 불황은 상처난 시장의 치유
 과정이다.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경제주체들이 착각을 일으켜 잘못된 투자로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불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불황은 잘못된 투자를 교정해 지속가능한 생산부문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겪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방해하면 불황은 더욱 심화된다. 일본의 1990년대 버블 형성과 붕괴, 그리고 이후 이어진 장기불황은 오스트리안 경기변동이론이 묘사하고 있는 경로 그대로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베 신조 정권은 양적완화 정책을 쓰며 돈을 마구 풀고 있다.
과정이다.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경제주체들이 착각을 일으켜 잘못된 투자로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불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불황은 잘못된 투자를 교정해 지속가능한 생산부문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겪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방해하면 불황은 더욱 심화된다. 일본의 1990년대 버블 형성과 붕괴, 그리고 이후 이어진 장기불황은 오스트리안 경기변동이론이 묘사하고 있는 경로 그대로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베 신조 정권은 양적완화 정책을 쓰며 돈을 마구 풀고 있다.안재욱 < 경희대 서울부총장·경제학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