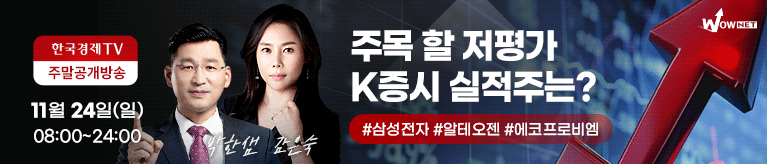재정준칙 76개국서 도입
[ 도병욱 기자 ]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페이고 제도를 도입했거나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0년에는 독일과 미국 등 5개국만 재정준칙을 운용했지만, 2012년에는 그 숫자가 76개국으로 늘었다.
미국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페이고 준칙을 도입한 적이 있는데 2010년에는 아예 영구법으로 부활시켰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다. 의무지출 증가나 세입감소를 유발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법안은 과거처럼 다른 법안(예산집행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법(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으로 존재한다.
2002년 시효 만료 이후 페이고 준칙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미 의회를 다시 움직인 것은 재정적자 증가였다. 2009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자 의회를 중심으로 재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미 하원은 이와 별도로 2011년 페이고보다 더 강한 조치인 ‘컷고(cut-go)’를 채택했다. 신규 의무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 확보가 아닌 다른 의무지출 감액으로만 상쇄해야 한다는 조치다. 미국은 이 같은 재정준칙 도입 이후 재정수지 적자규모(GDP 대비)가 2009년 13.3%에서 2012년 8.5%로 감소했다.
일본도 2010년 6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용은 미국의 페이고 준칙과 비슷하다. 일본은 당시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5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있다. 독일은 신규 채무 규모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는 준칙을 헌법에 포함했다. 스웨덴은 법률을 통해 27개 분야별 지출 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연금과 국가부채 이자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 증가율을 동결하는 지출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