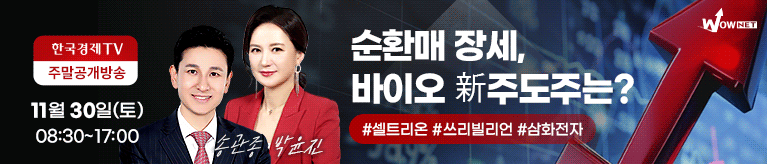인도 여성들이 양미간 사이에 붙이는 동그란 형태의 빈디(bindi·점). 제3의 눈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인도 전통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을 상징하는 표지다. 그러나 이것을 사각의 캔버스에 원형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면 불교의 세계를 상징하는 만다라가 된다. 한 남성에 대한 헌신과 복종을 뜻하는 기호가 세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성스러운 표지로 탈바꿈한다.
인도계 세계적 여성 작가 바티 커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접하는 일상적 오브제를 전혀 다른 맥락 속에 배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작가다. 오는 10월5일까지 사간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아노말리(Anomaliesㆍ기형)’전은 우리가 접하는 일상적 오브제가 갖고 있는 의미의 이중성에 주목한 전시다.
그는 1969년 영국 이주 인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뉴캐슬 폴리테크닉을 나왔다. 1992년 인도 여행을 갔다가 미술가 수도 굽타를 만나 결혼한 뒤 그곳에 눌러앉았다. 서구 문화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한 커는 인도에 살면서 서구와는 전혀 다른 인도 전통문화의 다양한 상징성을 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서구와 아시아 전통의 접목과 그로부터 생산되는 해석의 다양성에 주목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빈디 시리즈는 이런 작가의 의도가 집약된 작품이다. 빈디의 반복적 배열과 그것이 풍기는 종교적 초월성은 결혼이라는 현실과 만다라라는 초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빈디의 반복적 배열과 그것이 자아내는 정신적 성격에 대해 특별히 종교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며 “반복은 우리 일상 속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자신의 작품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의미의 이중성을 유도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조각 작품에서도 두드러진다. 여신 시리즈의 하나인 ‘클라우드 워커’는 성적 에너지를 대표하는 초월적 존재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해 신성과 괴물성, 인간성과 야수성을 겸비한 존재로 다가온다.
‘와크 나무’는 밀랍으로 주조한 찌그러진 동물의 머리를 열매처럼 매달아 만든 작품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가지 말라는 신탁을 무시하고 인도에 갔다가 죽음을 맞았다는 영웅 전설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이다. 신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함으로써 관람자에게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커는 “작품은 장소와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열린 자세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02)735-8449
정석범 문화전문기자 sukbumj@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 세계 최대 '공예 잔치'…청주비엔날레 9월 11일 개막
▶ 분단의 상징…남과 북의 경계, 예술이 되다
▶ 김동리 소설을 그림으로 즐겨볼까
▶ 물방울이 도대체 뭐길래…인생 전부를 걸었나
▶ 서민들의 애환…별이 되어 빛나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