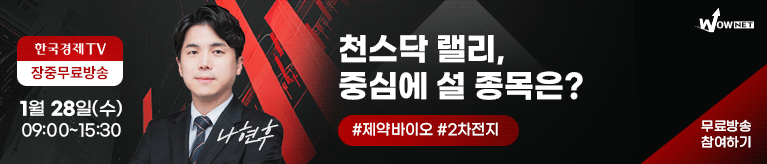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두바이=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페르시아만을 바라보고 형성된 아랍에미리트(UAE) 제2의 도시 두바이. '중동', '이슬람', '아랍'이라는 단어들은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이다. 하지만 거주자의 85%가 외국인인 두바이는 우리의 막연한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진주조개를 잡고 무역상이 오가는 작은 항구 도시였던 두바이는 반세기가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하늘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를 지어 올렸고, 바다에는 세상에 없던 인공섬 '팜 주메이라'를 만들었다.
땅에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쇼핑센터 '두바이 몰'과 최고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을 건설했고, 세상에서 가장 긴 무인 지하철은 노선을 확장하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두바이는 2020년 세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여전히 '공사중'이다.
거대한 공사장의 틈바구니에서, 선입견보다 훨씬 친근한 두바이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났다.

◇ 정착의 역사가 시작된 '올드 두바이'
두바이의 '크고 높고 화려한 사막 위의 인공 도시' 이미지가 너무 익숙하거나 흥미롭지 않다면, 혹은 그 실체에 압도되고 싶지 않다면 신시가지의 반대편, 정착의 역사가 시작된 '올드 두바이'(old dubai)로 먼저 가보자.
페르시아만의 바다가 흘러들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천 두바이 크릭(creek)을 기준으로 북쪽은 데이라(Deira), 남쪽은 버 두바이(Bur dubai)다.
버 두바이 지역의 알파히디 역사지구는 크릭을 통해 무역업이 번성했던 1900년대 세워진 전통 주거지역이다. 부유한 가정집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담벼락은 높고 거칠다.
고개를 들면 담벼락 꼭대기에 바람을 모아 집안으로 흘려보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바람 탑(wind tower)과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나무 배수로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완성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듯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작은 갤러리들을 들러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여행자들의 발길이 자꾸만 늦춰지는 사진 명소이기도 하다.
전통 아랍 커피는 물론 가루째 끓여내는 터키 커피와 에티오피아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 박물관이나 아기자기하게 꾸민 카페에서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정경을 즐기는 것만으로 끝내기엔 뭔가 아쉽고 궁금하다면 셰이크 모하메드 문화체험센터(SMCCU·Sheikh Mohammed Centre for Cultural Understanding)를 들러보자. 전통 가옥의 '마즐리스'에 둘러앉아 전통 음식을 먹으며 에미라티(Emirati)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

◇ 사막 유목민 후손의 환대 문화
에미라티에게는 아라비아반도의 유목민이었던 베두인족의 후손답게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손님이 오면 널찍한 응접 공간인 '마즐리스'(Majlis)에 둘러앉는다.
붉은 양탄자를 깔고 벽으로는 기댈 수 있는 쿠션이 놓인 마즐리스는 베두인의 텐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록돼 있다. 가족은 물론, 부족원, 이웃 주민, 멀리서 온 친지 등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이다.
이곳에서 아랍 커피와 대추야자(데이츠)를 대접한다. 로즈워터, 카다멈, 사프란이 들어간 아랍 커피 '가와'는 '달라'라는 멋스러운 주전자로 손잡이가 없는 작은 잔인 '핀잔'에 따라준다. 한두 잔을 마시고 더 원치 않으면 잔을 살짝 흔들면 된다.


커피와 곁들이는 대추야자는 BC 2500년부터 이 땅에서 재배해 온, 이들의 역사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특산품이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종려나무가 바로 대추야자 나무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이라는 대추야자는 국내에서 재배하는 대추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훨씬 크고 맛은 곶감에 가깝다.
본격적인 에미라티 식사로 빨간 고추가 들어간 병아리콩 요리 당고(dango)와 크림치즈를 발라 먹는 빵 카미르(khameer), 아침으로 주로 먹는 달콤한 짧은 국수 발라릿(balalit), 스튜와 비슷한 나시프(nashif), 인도식 쌀 요리 비리야니(biryani) 그리고 디저트로 데이츠 시럽을 뿌려 먹는 찹쌀 도넛인 루콰이맛(luqaimat)이 차려졌다. 뷔페처럼 각자 접시에 담아 먹는데, 웬만한 식당 못지않게 맛도 좋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면 아랍, 이슬람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전통 의상인 아바야(여성용)와 칸두라(남성용)는 어떻게 입는지부터, 일부다처제나 신의 존재까지 예민하거나 심도 있는 질문도 거리낌 없이 나왔다.
쉬운 영어로 진행되고, 아이들은 뒤쪽에서 마음껏 뒹굴뒹굴하거나 잠을 잘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이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남은 음식도 양껏 싸갈 수 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되는 브런치는 1인당 150디르함(4만5천원)이다. 월∼수요일 아침(10시)은 120디르함(3만6천원), 일∼목요일 점심(오후 1시)은 130디르함(3만9천원), 일·화·목요일 저녁(오후 7시)과 화·금요일 오후 티타임(오후 4시 30분)은 150디르함(4만5천원)이다. 홈페이지(www.cultures.ae)에서 컬처럴 밀(Cultural Meals)을 예약하면 된다.

◇ 아브라 타고 향신료 시장으로
알파히디 역사지구에서 크릭 건너 데이라 지역에는 전통 시장인 '수크'(souk)가 모여 있다. 1960년대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크릭 주변에서 이뤄지던 무역은 어업, 진주 채취와 함께 중요한 산업이었다.
데이라 지역의 수크에서는 당시 세계 상인들이 향신료와 직물, 금을 거래하던 모습이 남아있다.
크릭을 건너갈 때는 전통 목선인 아브라(abra)를 탄다.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앉는 아브라의 탑승 요금은 단돈 1디르함(300원). 수백 년 전부터 이용해 온 이 작은 나무배는 지금도 현지인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한다.
향신료 시장은 눈과 코가 즐거워지는 곳이다. 시나몬, 각종 후추, 커민, 울금 등 향신료와 장미, 라벤더, 히비스커스, 카밀러(캐모마일), 재스민 등 말린 꽃, 찻잎, 향(香) 등이 빼곡하다.

한 번쯤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은 가장 비싼 향신료라는 사프란이다. 다른 향신료들처럼 밖에 진열돼 있지 않고, 매장 안에 들어가서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사프란은 붓꽃과에 속하는 사프란 크로커스 꽃의 암술대를 말린 것이다.
사프란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스페인식 리소토인 파에야가 가장 익숙하다. 액체에서 우러나면 노란색을 내지만 암술대는 붉은빛이다.
꽃이 피는 시기는 가을의 2주 안팎. 꽃 한 송이에 단 세 개의 암술대가 있고, 섬세한 수작업으로만 채취할 수 있다. 1g의 사프란을 얻으려면 1천개의 암술을 따서 말려야 한다.
고급 사프란이 금보다 비싼 이유다. 현재 국내 온라인에서 1g에 2만5천원대에 검색되는데, 현지에서는 3g에 70디르함(2만1천원) 정도면 적당히 질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다.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탐낼 만하다.
인근의 금 시장, 직물 시장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월간 '연합이매진' 2019년 4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