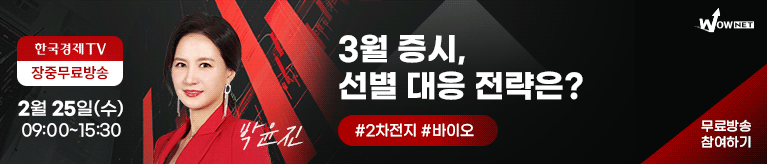인도 전통놀이에서 유래…2014 인천 대회에서 남자 첫 동메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전체 40개 종목을 인지도 순으로 줄 세운다면 맨 뒤에는 아마 '카바디'가 서게 될 것이다.
이름조차 생소하고 구기인지 격투기인지 감도 안 잡히는 종목이지만 이미 1990년부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치러졌고, 4년 전 한국에 첫 동메달을 안기기도 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우리나라는 남녀 카바디 대표팀을 출전시켜 동반 메달을 노린다.
'숨을 참는다'는 뜻의 힌두어에서 유래한 카바디는 인도의 오랜 민속놀이를 변형한 종목이다.
경기 방식은 술래잡기나 공 없이 하는 피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10mX13m(여자 8mX12m) 규격의 코트에서 각 팀 7명씩의 선수가 진영을 나뉘어 선다.
공격권을 가진 팀에서 '레이더'로 불리는 선수 한 명이 상대 코트에 들어가 '안티'로 불리는 수비 선수들을 터치하고 돌아오면 득점하는 방식이다. 터치 1명당 1점이며 손발을 모두 써도 된다.
이때 레이더는 상대 코트로 들어간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카바디! 카바디!'라는 구호를 또렷한 소리로 쉼 없이 외쳐야 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을 '칸트'라고 하는데 구호를 멈추면 '칸트 아웃'돼 점수와 공격권을 내준다.

수비 선수들은 레이더의 터치를 피하다 기회를 봐서 레이더를 제압할 수 있다. 레이더가 자기 진영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제압하면 심판의 판정에 따라 수비가 점수를 얻는다.
30초간 공격이 끝나면 상대 팀에 공격 기회가 넘어간다. 7명의 선수 중 어느 선수가 레이더로 나설지는 팀의 전략이다.
공수를 번갈아 전후반 20분(여자 15분)씩 경기해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긴다.
거친 몸싸움이 있기 때문에 격투기 종목처럼 계체하고, '용의 검사'도 한다.
이번 대회부터 체중 상한이 상향돼 남자 85㎏, 여자 75㎏까지 출전할 수 있다. 손톱이 길거나 반지, 시계 등 금속을 착용하면 안 된다.
남자는 1990년, 여자는 2010년에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 됐는데, 종주국 인도가 정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한국은 2010 광저우 대회부터 출전해 2014 인천 대회에서 남자가 동메달, 여자가 5위를 했다.
2007년에야 대한카바디협회가 설립된 짧은 역사와 실업팀 하나 없는 얕은 저변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대회에선 남녀 모두 메달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이란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는 은메달, 남자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승은 역시 인도였다.
그렇다고 인도가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남자 대표팀은 2016년 인도 카바디 월드컵 개막전에서 인도를 34-32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재호 총감독, 설동상 코치, 아산 쿠마르 외국인 코치가 이끄는 이번 대표팀은 남자 12명, 여자 11명으로 이뤄졌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카바디에 입문한 선수들이다.
경력은 길지 않지만 남자 선수들 대부분이 인도 프로리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인천 대회 동메달 주역인 이장군(26·벵골 워리어스)은 인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인기를 누렸다.
여자팀의 경우 아직 인도에도 프로리그가 없어 '카바디로 먹고살기'가 쉽지 않지만 김지영(25), 김희정(25) 등 선수들이 일취월장한 실력으로 첫 메달에 도전한다.
이상황 대한카바디협회 처장은 "구호를 외치며 거친 동작을 해야 하는 카바디는 민첩성과 근력은 물론 심폐 지구력까지 필요로 하는 스포츠"라며 "인도에선 프로 출범 첫 경기 시청률이 크리켓을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최근 규칙을 보다 박진감 넘치게 바꾸는 등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남녀 모두 메달이 가능하다"며 이번 아시안게임이 국내 카바디 대중화에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